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떠올리면 건설·제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828명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417명)·제조업(184명) 순이었습니다. 제조업 중에선 철강·화학·조선 등 대표적인 ‘굴뚝산업’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현장에서 폭발사고의 위험이 큰 업종인 만큼 매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죠.
|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여파는 비단 제조업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의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 3개사를 지칭하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넥슨은 최근 안전보건 관리 영역을 협력사의 재해 예방까지 넓혔고 앞으로 전담 조직도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넥슨 관계자는 “현재 사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련 지속 관리에 나서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도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3N의 공통점은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측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하는 게 골자입니다. 게임 업체들은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하지만 이 같은 게임 업체들의 행보가 의아스러운 시각도 있을 겁니다. 폭발 위험도 없고 현장에서의 사고도 없을 것 같은 게임 업계가 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발 빠르게 나서는 걸까요. 산업재해의 범위를 약간 넓게 설정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단순 폭발 사고, 붕괴 사고뿐만 아니라 과로, 갑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현재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고된 근무강도로 유명한 IT, 특히 게임 업계도 남의 일이 아니죠.
‘과로로 설마 사람이 죽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서 2016년 게임 업계에 과도한 근무로 개발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 게임사의 20대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2017년 정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게임 업계의 과도한 근무량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3N 같은 대형 게임사들이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 52시간 제도 정착, 포괄임금제 폐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근무 환경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단면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단위 매출 산업으로 성장한 국내 게임 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고를 넘어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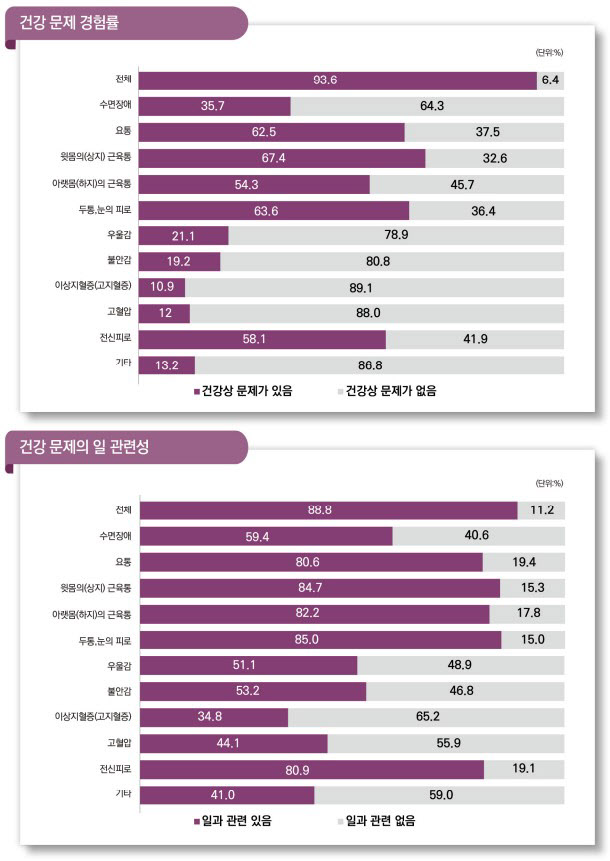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 나인퍼레이드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496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232t.jpg)

![[포토]영화 속 배경에서 찰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369t.jpg)
![[포토] 아수라장된 기자회견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115t.jpg)
![[포토]다양한 식음료가 한 자리에, '컬리 푸드페스타 2024'](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958t.jpg)
![[포토]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743t.jpg)
![[포토]북적이는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708t.jpg)
![[포토] 미소짓는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574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