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특히 한국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사 사회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증원의 배경으로 소아과 폐업과 ‘뺑뺑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꼽고 있는데, 의사 수 확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 |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진= 연합뉴스) |
|
의협은 우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대 증원의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숫자(2.5명)는 OECD 평균(3.6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0~2020년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2.84%)이 OECD 평균(2.19%)보다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면 활동 의사 숫자도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필수과의 낮은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 소송 등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만들어주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피부과·성형외과 등 이른바 ‘돈 되는 과‘에 대한 의사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일본에서 의사 수 확대 정책을 폈지만 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 등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의협이 요구하는 대책은 의료수가의 정상화다. 지난 5년간 수백개의 소아청소년과가 경영난으로 폐업한 원인이 낮은 의료수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늘어난다하더라도 소아과를 개업하려는 의사는 없을 것이란 논리다. 실제 지난 10년간 의사가 꾸준히 배출돼 숫자는 늘었지만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하는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 의료를 왜 하지 않느냐’는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가 저수가였다. 필수 분야의 저수가로 인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나라의 수가는 외국 수가의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된다. 맹장 수술 같은 경우 미국의 1/4,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이 큰데,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다고 강조한다. 최선을 다하고도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기피과에 대한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앞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 7명이 기소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당사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 같은 사례를 본 후배 의사들은 이와 관련한 과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 원장은 “최근에 진단을 잘못했다고 의사를 구속하는 판결도 있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의사도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진단을 못 했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해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법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며 “남발되고 있는 법적소송과 거액의 배상금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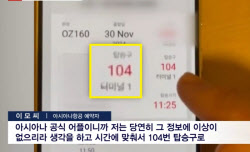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포토]최상목 "野 감액안 허술한 예산…무책임 단독 처리 깊은 유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44t.jpg)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1074b.jpg)

!["1.5억의 위용".. 강남에 뜬 '사이버트럭' 실물 영접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94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