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원 전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 출석해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용우 사회본부장으로부터 ‘전경련이 주도로 재단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팀장은 미르재단과 설립을 위한 청와대 회의에 이 본부장과 함께 전경련 측 인사로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면 첫 조사부터 사실대로 진술이 가능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전경련 내부가 ‘어차피 다 알려질테니 진실을 밝히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은 이날 미르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의 개입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2015년 10월 21일 이 본부장과 함께 청와대 1차 회의에 참석했다며 회의 참석 전까지 전경련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팀장은 최 전 비서관이 4차례 청와대 회의를 통해 ‘재단 출연 약정서’·‘재단 등기 신청일’·‘재단 사무실’·‘이사진 명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회의에서 ‘이사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최 전 비서관이 ‘내일 받아서 주겠다. 나도 안 전 수석에게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3차 회의에서 출연약정서를 다 받지 못했다고 최 전 비서관이 ‘명단을 달라’며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미르재단 설립 후 이성한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전경련 직원 파견 요구를 거부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다. 그는 “최 전 비서관이 이승철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해 ‘이용우 본부장이 뻣뻣하다’고 해 미르재단에 케익을 사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은 K스포츠재단 역시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모든 사항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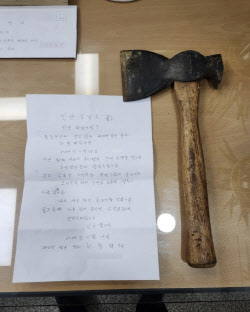





![[포토]12월 LPG 국내 프로판 가격 인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32t.jpg)
![[포토]초코과자 가격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24t.jpg)
![[포토]점등 앞둔 사랑의 온도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12t.jpg)
![[포토]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94t.jpg)
![[포토]짙은 안개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27t.jpg)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엔화 강세’가 촉발한 달러 약세…환율 1390원대 지속[외환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119h.jpg)
![반백년 두 가정 두고 살아온 할아버지의 상속 고민, 결국[별별법]](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07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