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층간소음으로 환청도 겪는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천창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늦은 시간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로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중재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아파트로 가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계속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9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거주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매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며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기도 했다는 김지선(26)씨는 “이곳도 멀쩡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매번 대책에서 빠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근거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비공동주택이 빠져 있고, 관리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에)비공동주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범사업(서울 중구, 광주광역시)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내년엔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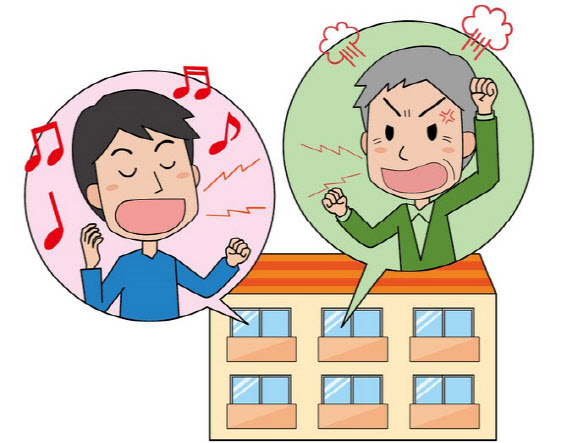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신장 면화 안산다고? 유니클로 불매” 들끓는 中 민심[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901024b.jpg)

![[단독]의협, 전공의 투표 독려 위해 21억원 투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90100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