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가 하태임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연 개인전 ‘그린 투 그린’에 내놓은 설치작품 ‘그린과 그린 사이’(2023) 앞에 섰다. 이번 개인전의 표제작이기도 한 작품은 캔버스에서만 직조하던 ‘색띠’를 설치로 옮겨낸 첫 작업이다. 오른쪽 뒤편으로 연한 녹색부터 짙은 녹색까지 변주해낸 ‘통로’(Un Passage) No.221059(2022·130×162㎝)가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평범한 날이었다. 아니다. 평범치 않았나 보다. 이제 와 돌아보니 그랬던 거다. 그림 그리는 아버지와 그 재능을 이어받은 딸 사이에 흔히 오가는 그런 얘기였을 뿐, 대단한 화젯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유독 왜 그날이 기억에 남았을까. 오래도록 묻어뒀을 텐데, 30년을 훌쩍 넘긴 지금에야 왜 하필 그 장면이 떠올랐을까.
1989년 5월 어느 날 서울 성북구 휘경동 위생병원 뒷정원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휠체어를 미는 열여섯 살 딸. 당시 그 딸이 처한 상실감을 상상하긴 어렵지 않다. 아버지의 암투병이 길어지면서 어떤 위로도 삼켜버리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을 거다. 그랬던 때 문득 이런 대화가 오갔던 거다. “넌 무슨 색이 제일 좋니” “난 그린 컬러가 제일 예뻐. 연두색, 봄에 새로 피는 잎들 색 말이야. 아빠는?” “딥그린, 암녹색.”
 | |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트사이드갤러리 하태임 개인전 ‘그린 투 그린’ 전경. ‘그린’을 주제로 층층의 다채로운 녹색을 펼쳐낸 회화작품들이 나란히 걸렸다. 왼쪽부터 ‘통로’(Un Passage) No.221059(2022·130×162㎝), ‘통로’(Un Passage) No.221043(2022·140×140㎝), ‘통로’(Un Passage) No.221053(2022·130×130㎝), ‘통로’(Un Passage) No.231003(2023·130×162㎝)(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였다고 했다. 청색을 가장 잘 쓰던 작가였던 아버지가 뜻밖에 ‘녹색이 좋더라’고 했던 게 의아했을 뿐. 사실 더 파고들 여유도 없었을 거다. 그해 11월, 아버지 하인두(1930∼1989) 화백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 한국추상화 1세대로 꼽히는 화백은 한때 한국화단을 휘감은 앵포르멜(즉흥적 행위, 격정적 표현을 중시한 전후 유럽의 추상미술)을 녹인 붓터치로 두툼한 추상화면을 만들었다. 특별한 것은 그 위에 앉힌 ‘한국적’이란 주제. 전통색이 도드라진 단청 이미지, 불교적 원리·철학을 실어낸 만다라 등으로 강렬한 붓길을 냈더랬다.
그래. 지난 일이란 게 그렇지 않은가. 그저 스쳐 가는 한 토막이려니 했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되살아나 떡하니 길목을 막아서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넘어야 할 산도 되고, 건너야 할 강도 된다. 잊고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질 수도 있었던 그것이.
 | | 하태임의 ‘통로’(Un Passage) No.221065(2022·130×162㎝). 넓적한 고무밴드를 쭉 잡아당긴 듯한, 순하게 바탕색을 깐 화면에 반곡면의 굵은 띠를 척척 올리고 겹쳐내는 건 작가의 오랜 테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작가 하태임(50)에게도 그랬나 보다. 별별 색, 별별 겹침·중첩·교차·반복으로, 색과 색의 조화는 물론 갈등, 타협까지 빼냈더랬다. 그런 작가가 열여섯 살 때도, 지금도 여전히 가장 좋아한다는 녹색이, 그이를 막아서는 산과 강이 될 줄은 몰랐을 거란 얘기다.
“그린이란 색을 가장 좋아하고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린과 그린을 중첩해보자고 하니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다.” 그러면서 오래전 그 장면을 떠올렸나 보다. “내가 생각한 그린과 아버지 당신이 생각한 그린은, 수많은 경험과 기억이 만든, 다른 색이었구나.”
결국 작가는 그 층층의 다채로운 그린을 펼쳐내기로 했다. 연두색부터 암녹색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펼친 개인전 ‘그린 투 그린’(Green to Green)은 그렇게 시작했다.
 | | 작가 하태임이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연 개인전 ‘그린 투 그린’에 내놓은 회화작품들 앞에 섰다. 작가 뒤로 ‘통로’(Un Passage) No.221043(2022·140×140㎝), ‘통로’(Un Passage) No.221053(2022·130×130㎝), ‘통로’(Un Passage) No.231003(2023·130×162㎝), ‘통로’(Un Passage) No.221068(2022·182×227㎝)이 나란히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화면엔 ‘흠’ 들이고 전시장엔 ‘설치’ 들이고 넓적한 고무밴드를 쭉 잡아당긴 듯한, 그 상태에서 잘 드는 가위로 싹둑 잘라낸 듯한, 그렇게 뚝뚝 분질러진 색 토막. 작가가 해온 작업이 그랬다. 순하게 바탕색을 깐 화면에 반곡면의 굵은 띠를 척척 올리고 겹쳐냈더랬다. 관건은 화면을 주도하는 색과 조력하는 색의 조화. 주제에 따라 시기에 따라 조색해내는 그 색의 변화가 핵심이었던 거다. 어떤 때는 ‘노랑’으로, 어떤 때는 ‘분홍’으로, 그러다가 이번엔 ‘녹색’에까지 이른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란다. 이른바 색띠의 탄생이 말이다. “문자를 넣고 지워내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띠가 생겼던 것”이라고 하니. “지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그 행위만 드러났던 화면이 점점 정돈되면서 생명체를 가진 띠가 된 거다.”
 | | 아트사이드갤러리 하태임 개인전 ‘그린 투 그린’ 전경. 왼쪽은 ‘통로’(Un Passage) No.221043(2022·140×140㎝), 오른쪽은 ‘통로’(Un Passage) No.221053(2022·130×130㎝)(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사실 작가의 초기작은 여백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색 잔치처럼 보인다. 알록달록하게 꽉 채운 총천연색 바닥을 흰띠로 지우고, 노란띠로 지우고, 붉은띠로 지우고. 결국 그 풍요로운 잔치에서 하나씩 둘씩 색띠를 빼버린 진화를 거쳤다고 할까. “반곡면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작품에는 팔 뻗어 그리는 행위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남들이 볼 땐 똑같아도 내 궤적이 캔버스 안에서 뭉치기도 흩어지기도 하면서 리듬감을 잡아낸다.”
한 띠가 한 획이려니 했던 지레짐작도 바로잡아줬다. “묽은 톤으로 칠하고 마르면 다시 칠하기를 4∼5회 반복한다”는 거다. 빨간 띠는 다섯 번쯤 칠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만 노란 띠는 12번은 칠해야 ‘작품성’을 얻는단다.
 | | 아트사이드갤러리 하태임 개인전 ‘그린 투 그린’ 전경. 컬러밴드 작업 중 90×90㎝ 규모로 제작한 ‘통로’(Un Passage·2023) 연작 9점을 한데 모았다. 사선 방향 오른쪽으로는 ‘통로’(Un Passage) No.221065(2022·130×162㎝)가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녹색이란 테마를 들인 것 외에 이번 개인전에선 분명한 변화 하나가 더 보인다. ‘흠’이다. 한치의 이탈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이가 뚝 떨어진 물감 자국도 그대로 두고, 먼지 같은 띠의 흔적을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 자유롭고 역동적이다 못해 마치 칠하고 지워내고 다시 칠했던, 초기작으로 돌아간 듯하달까.
그런데 다소 거칠어 보이는 새로운 화면이 작가에겐 ‘숨통을 틔우는 일’이었나 보다. “오랫동안 컬러밴드 작가로, 명상하듯 수련하듯 지루하고 고요한 작업뿐이었는데, 그 위에 다른 호흡이 들어간 것 같아 재미있더라.”
 | | 하태임의 ‘통로’(Un Passage) No.221068(2022·182×227㎝). 오른쪽은 확대해서 본 부분이다. 화면에 뚝 떨어진 작은 물감의 흔적을 그대로 방치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번 개인전에서 드러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 | 하태임의 ‘통로’(Un Passage·2023) 연작. 컬러밴드 작업 중 90×90㎝ 규모로 제작한 9점을 한데 모았다. 마치 붙였다 떼어낸 듯한, 먼지 같은 색띠의 흔적을 일부러 만든, 새로운 시도가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용기의 문제’ 아니다 ‘색의 문제’다 변함없이 ‘통로’(Un Passage)란 연작명으로 신작 30여점을 내놓은 전시에 사실 화룡점정은 따로 있다. 화면으로만 빚어내던 색띠를 설치작품으로 꺼내놓은 거다. 수십개의 알루미늄 막대를 늘어뜨린 공간에 섬유색띠를 대롱대롱 매달아 입체적이고 분방하게 표현했는데, 첫 입체작업에 붙은 작품명은 ‘그린과 그린 사이’(Between Green and Green·2023).
“천을 겹쳐 바느질을 하고, 막대에 구멍을 뚫고 락커칠을 하면서 예전의 열정이 되살아났다고 할까. 정적인 2차원 캔버스를 떠나 공간에서 작업을 풀어낸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영감을 얻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
 | | 작가 하태임과 설치작품 ‘그린 투 그린’(2023). 여러 겹의 천을 덧대 하나하나 작가 직접 바느질해 만든 섬유색띠를 알루미늄 막대에 대롱대롱 매달았다. 이번 개인전의 표제작이기도 한 작품은 캔버스에서만 직조하던 ‘색띠’를 설치로 옮겨낸 첫 작업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 | 하태임의 설치작품 ‘그린 투 그린’(2023)을 확대해서 본 부분. 색색의 천을 여러 겹 덧댄 바느질 자국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 | 하태임의 ‘통로’(Un Passage) No.222009(2022·130×162㎝). 설치작품 ‘그린 투 그린’(2023)의 모태가 된 회화작품이기도 하다. 얇고 정교한 스트라이프를 배경에 굵은 컬러밴드를 앉힌 화면은 작가가 초기부터 내보였던 구성 중 하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하지만 변화란 게 말처럼 그리 쉽던가. 과연 ‘용기의 문제인가’냐고 물었더니 좀더 단호한 대답이 돌아온다. “아니다. 색의 문제다. 색이란 실마리를 찾으니 형태는 없어지더라. 사실 뭘 그리려는 의도는 없다. 그저 색이 지나가는 거다. 몸이 축이 되고 손이 날개가 돼 반곡면의 색띠가 생긴다. 색을 담아내는 그릇처럼 가장 유연하고 완벽한 게 색띠란 생각이다.”
이만하면 색을 빚고 겹치는 데 도가 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어색하고 어렵기만 하단다. “색 고르는 일은 즐거움이지만 그저 잠깐일 뿐. 반복의 지루함을 참아내는 게 힘들다. 시지각을 감탄시킬 때까진 색을 올리고 말리고 올리고 말리고, 더딘 일상과 싸운다. 마치 씨앗의 발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러면 그렇지. 보이는 그림이 즐겁다고 그리는 일까지 즐겁겠는가. 그 지난한 색의 중첩을 보면서, 그해 5월 세대 간의 중첩을 만들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게 되레 자연스러워졌다. 색띠 혹은 컬러밴드로 교차·반복해온 작가의 작업도 결국 색을 파트너로 잡은 ‘시간의 중첩’을 풀어내는 일이었을 테니. 전시는 4월 1일까지.
 | | 작가 하태임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연 개인전 ‘그린 투 그린’에 내놓은 회화작품들 앞에 섰다. 90×90㎝ 규모로 제작한 ‘통로’(Un Passage·2023) 연작 9점 중 6점이 배경이 됐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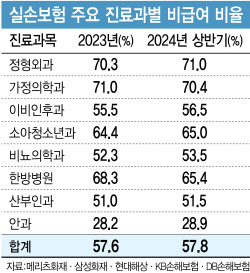




![[포토]마다솜,통산 4승 만들어준 넘버원 볼](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280t.jpg)
![[포토]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253t.jpg)
![[포토] 소방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 불 신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60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14t.jpg)
![[포토]의협 대의원총회 참석하는 임현택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95t.jpg)
![[포토]잠시 쉬어가는 서울야외도서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81t.jpg)
![[포토]‘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59t.jpg)
![[포토]정부, ‘비위 혐의 다수 발견’ 이기흥 체육회장 등 경찰 수사 의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27t.jpg)
![[포토]수능대박을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02t.jpg)
![[포토]가을의 추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165t.jpg)

![[포토]마다솜,저의 볼 마크입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10028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