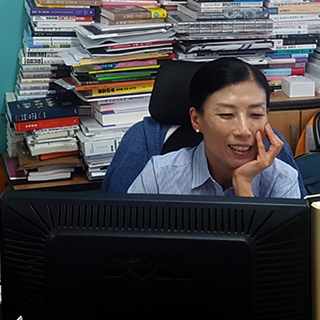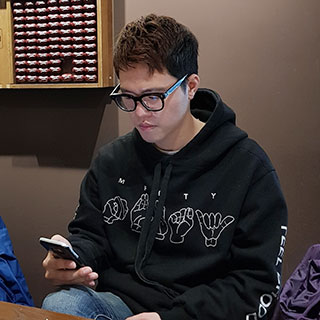문화부
오현주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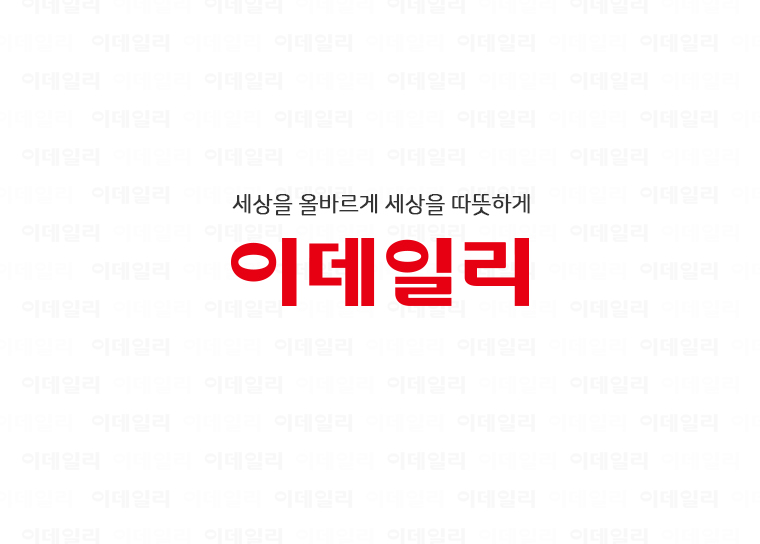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이념 프레임 걷어내니…비로소 보이는 풍경 [국현열화]<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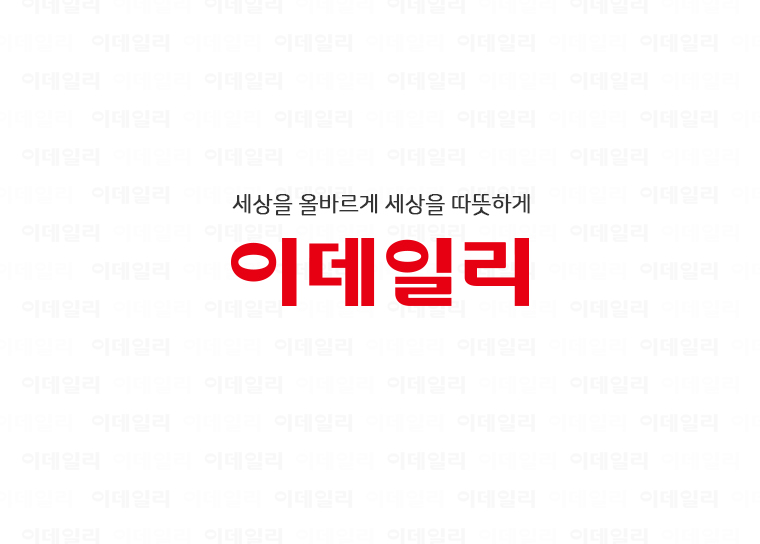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시대가 작아… 미처 품지 못한 이야기 [국현열화]<3>
동그라미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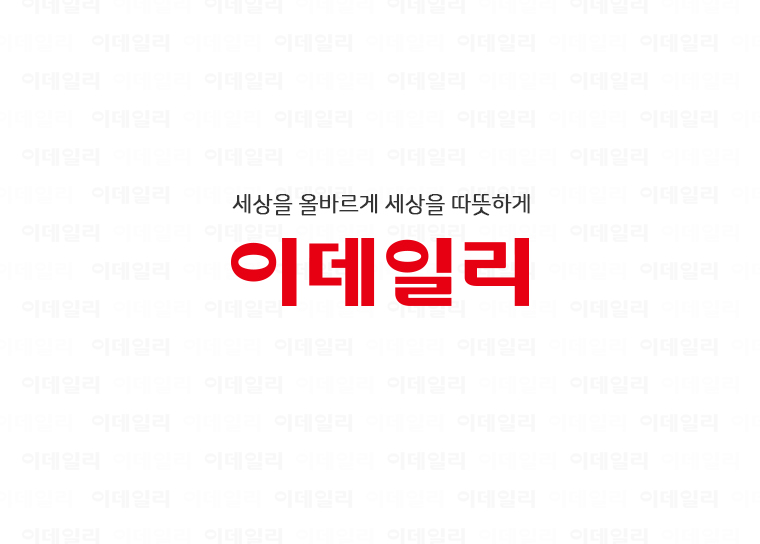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들리시오? 화합 부르짖는 먹먹한 함성 [국현열화]<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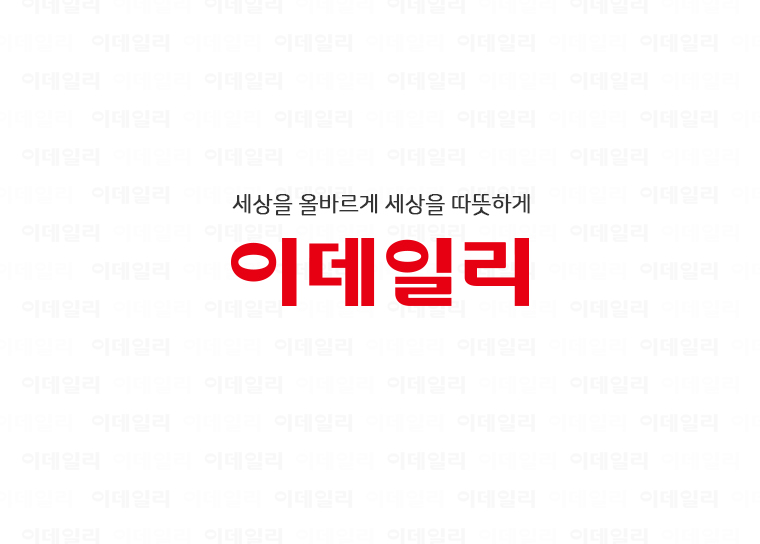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폐허에도 싹은 트고 새는 난다 [국현열화]<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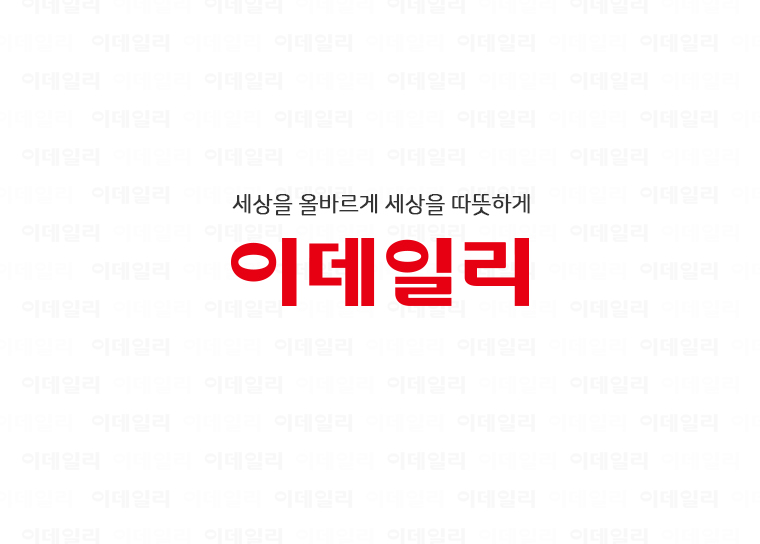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오래됨
- 의심을 부른다, 저 탱탱한 꽃이 [e갤러리]
더보기
e갤러리 +더보기
-
![의심을 부른다, 저 탱탱한 꽃이 [e갤러리]](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 의심을 부른다, 저 탱탱한 꽃이
- 오현주 기자 2025.02.28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이쯤 되면 나비부터 의심해야 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실인지 환상인지. 노송을 그려둔 벽에 새들이 날아와 부딪쳤다는 솔거(신라시대 화가)의 소나무 그림이 남의 일 같지 않단 얘기다. 당장 손끝을 부르는 저 꽃그림이 살아있는 나비를 불렀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박종필 ‘프레시-엠 no.37’(2024 사진=박여숙화랑)의심을 부르는 그림. 작가 박종필(48)의 작업이 바로 그거다. 작품마다 빠짐없이 화면을 채우는 ‘꽃’은 사실 그저 도구일 뿐. 꽃으로 채우는 미적 성취감이 작가 작업의 핵심은 아니란 얘기다. 탱탱한 생화 사이에 더 탱탱한 조화를 박아두곤 말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우아하게 이르고 있으니까. 생화와 조화를 식별해내는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진짜일 리가 없다는 철학을 심어둔 거다. 게다가 이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는다. 꽃 사는 일이 사람 사는 일과 다를 게 없다는 성찰 말이다. 인간세상에도 진짜와 가짜는 섞여 있기 마련이라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조화롭게 뒤섞여 살지만, 때론 그런 풍경이 더 친밀하다는 의미를 녹여서 말이다. 종종 극사실주의 기법의 잣대가 되기도 하는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나’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산 것과 죽은 것의 구획을 횡단한다. 신이 그어둔 금을 자유롭게 오가는 경지라고 할까. 달랑 붓 하나 들고선 말이다. ‘프레시-엠(Fresh-m) no.37’(2024)은 그 절정을 향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다. 색이면 색, 기량이면 기량, 갈수록 밀도가 짙어진다. 3월 13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월로 38길 박여숙화랑서 여는 개인전 ‘비트윈, 프레시-엠’(Between, the Fresh-m)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오일. 163×262㎝. 박여숙화랑 제공. 박종필 ‘프레시-엠(Fresh-m) no.43’(2024), 캔버스에 오일, 80.3×100㎝(사진=박여숙화랑)박종필 ‘프레시-엠(Fresh-m) no.27’(2023), 캔버스에 오일, 163×262㎝(사진=박여숙화랑)
-
![눈보다 마음 들이밀어야 보이는 장면 [e갤러리]](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 눈보다 마음 들이밀어야 보이는 장면
- 오현주 기자 2025.02.24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누구나 할 수 없다. 저런 포근한 상상은 말이다. 눈보다 마음을 들이밀어야 하는 일이니까. 선인장 속에 집을 만든 부엉이들이 창가에 매달려 세상구경을 하는 장면이 흔한 구경거리는 아니지 않은가. 강다연 ‘가족’(2024 사진=아르브뤼미술상)작가 강다연은 그렇게 마음을 크게 뜬 채 동물을, 또 식물을 그린다. 동식물을 그리는 여느 화가와 조금 다르다면, 일상언어 대신 조형언어로 하는 소통이 더 쉽다는 거다. 작가에게는 발달장애가 있다. 명암도 없고 원근도 없이, 지독하게 매달리는 세밀한 묘사가 작가 작업의 특징이다. 육안으론 볼 수 없는 속 깊은 질감이 튀어나올 정도니까. ‘가족’(2024)은 그 장기로 동물 중 가장 좋아한다는 부엉이 일곱 식구의 한때를 포착한 작품. 덕분에 이들 가족은 닮았으나 똑같지는 않은 저마다의 개성까지 입었다. 뾰족하게 덮이는 게 당연했던 ‘선인장 가시’에도 배려가 닿았다.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켜줄 막”이라고. 나이프로 일정하게 아크릴물감을 얹어 부드럽지만 강한 그 막을 빚었다. 3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KCDF갤러리서 여는 그룹전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에서 볼 수 있다. 신경다양성(발달장애) 미술가를 대상으로 공모한 ‘제3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을 수상한 작가 13명의 작품들로 꾸렸다. 최우수상 수상작 ‘가족’을 비롯해 대상 수상작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이백조 선생님’(이진원) 등 45점이 걸렸다. 캔버스에 아크릴. 116.8×91㎝. 아르브뤼미술상 제공.
-
![붓이 다 시킨 일이다…뜯긴 나무벽지도, 파닥이는 벌새도 [e갤러리]](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 붓이 다 시킨 일이다…뜯긴 나무벽지도, 파닥이는 벌새도
- 오현주 기자 2025.02.19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나무문양 벽지가 뜯겨 나갔나. 거칠게 잘린 단면 뒤로 하늘이 보인다. 뭉실뭉실한 구름을 배경 삼아 파닥거리는 새들은 ‘깜짝 게스트’다. 여기까진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시점이다. 권소진 ‘구름의 비밀’(2025 사진=아트사이드갤러리)사실 이 장면에는 반전이 둘 이상 들어 있으니까. 우선 저 바탕은 나무문양 벽지가 아니다. 급하게 수선한 듯 덧붙인 조각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물감 묻힌 붓으로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란 거다. 먼 하늘도, 흰 구름도, 오려붙인 듯한 새들도 마찬가지다. 의도한 착시 효과는 아니다. 작가 권소진(34)은 이 감쪽같은 작업을 통해 “무엇을 그림으로 보는가에 대해 질문하려” 한다니까. 뭐가 현실인지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던지는 숙제라고 할까. 자못 묵직한 사명을 띤 ‘구름의 비밀’(2025)이 가진 반전은 더 있다. 벽에 걸리지 않은 작품이란 것. 같은 결의 마룻바닥에 던져져 현실과 허구를 더욱 자유롭게 넘나들게 한 거다. 작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새’에도 사연이 있다. 어린 시절 한 번 본 뒤 20여 년을 철석같이 믿었던 ‘벌새’라는데. 하지만 본래의 정체가 ‘벌새인 척하는 나방’으로 드러나며 작가 작업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됐다. 진짜와 가짜를 넘나드는, 아니 헷갈리게 하는 메신저라고 할까. 2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6길 아트사이드갤러리 내 아트사이드템포러리서 여는 개인전 ‘벌새를 보았다’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각 130×89.5㎝(2점). 아트사이드갤러리 제공. 권소진 ‘관찰일지 1’(2024),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130×162㎝(사진=아트사이드갤러리)권소진 ‘새들은 바람을 마주본다’(2023),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130×162㎝(사진=아트사이드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