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4일자 32면에 게재됐습니다. |
|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부주필로 일하는 저자가 10년 탐사와 취재로 조직의 성공비결을 집대성했다. 침체에 허덕이던 조직이 부활하거나 해묵은 한계를 깰 수 있는 비법을 `이기는(winning)` 다른 조직들에서 찾아낸다. 괄목할 성장을 이룬 지구촌 20개 조직을 추려내고, 그 속에서 `영업정보`를 빼냈다. 흔한 생각처럼 조직을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도시와 국가까지 망라했다.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부터 세계 최고 빈민가 `뭄바이`까지 아울렀다. 인도의 LA라 불리는 첨단산업의 요체 `방갈로르`, 기부로 도박 그 이상을 보여주는 홍콩의 `자키클럽`, 마약중독자 재활사업에 성공한 스위스 `취리히`, 휴대전화로 대륙의 얼굴을 바꿔버린 `아프리카` 등등, 다채로운 주제와 내용이 걸러졌다.
에든버러로 돌아가 보자. 축제의 가장 큰 성공비결로 꼽힌 것은 열린시장의 창출이다. 에든버러는 시장 조성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거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냥 시장을 억압할 수 있는 관료적 장벽을 제거했을 뿐이다. 하향과 상향의 접근방식, 그 양쪽을 결합한 것도 주효했다. 모든 계획은 일방의 검토로 추진되지 않았다. 탁월한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직의 결정적인 강점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충고도 있다. 독일의 산업정책이 적절한 예로 잡혔다. 독일은 특정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업을 끌어내지 않았다. 소기업은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는 판단이다. 소기업은 고객을 따라 분야를 개척하고 기술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맞다. 기초 없이 혁신을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조직은 모두 서로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업과 도시, 국가를 구분한 건 단순히 규모와 인프라 차이 때문이 아니다. 연결고리의 확장이란 전제에서다. 기업은 도시와 기반시설을 공유한다. 도시는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또 국가는 기업의 성장동력을 키워 무역전쟁의 탄환으로 쓴다. 성공적인 조직에는 예외없이 사명감이 자리한다는 점도 짚었다. 돈이 목표가 아니다. 가치를 좇으니 성공이 따라붙더란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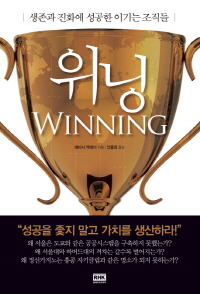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포토] 대통령실 입구의 취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817t.jpg)
![[포토]'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571t.jpg)
![[포토]'긴박했던 흔적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485t.jpg)
![[포토]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탄핵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366t.jpg)
![[포토]尹, '비상 계엄 해제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27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