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가 사용한 스마트폰 속도 측정 앱인 벤치비(BENCHBEE) 측정 방식은 정지 상태에서 측정하기에 기지국 간 이동성 확보가 중요한 5G 구조와 맞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 제시하는 등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5G 속도 측정을 위해 방법론 연구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가 ‘SK텔레콤은 5G가입자에게 LTE와 5G망을 함께 써서 SK텔레콤 LTE 가입자들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자, SK텔레콤은 ‘5G와 LTE 망을 동시에 쓴 덕분에 최대 2.7Gbps 속도를 제공한다. LTE 투자도 우리가 제일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언제쯤 2.7Gbps 속도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답하지 못했다.
통신사들은 어떤 기업이 5G 시설수(무선국과 장치수)가 많은가, 커버리지가 넓은가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인다.
실제 커버리지는 단순히 시설수뿐 아니라 기업의 네트워크 전략도 영향을 미친다. 무선국에서 운영되는 장비의 종류(8개의 앰프별 출력포트를 가진 8T패시브 장비냐, 32개의 안테나 소자가 합쳐진 액티브 장비냐 등)에 따라 무선국 관리기준상 집계되는 장치수도 다르다.
그런데 KT는 시설수 기준으로 1위라 자랑하고, SK텔레콤은 무선국보다 장치수가 많은 것은 외연적 커버리지 확대보다는 집중 지역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관심을 뒀기 때문이라 한다. LG유플러스는 무선국 대비 장치수가 적은 것은 최적의 셀 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장비를 구축한 덕분이라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통신사마다 전략이 다르고 5G 장비 구축 초기 단계여서 비교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도 통신 서비스의 세대(G)가 변할 때마다 기지국 숫자 논쟁이나 통신 품질 논쟁은 있었다.
SK텔레콤이 1998년 탤런트 김규리와 김진 씨를 모델로 선보인 ‘스피드011 지하카페’ 편 광고는 PCS 사업자들(KTF·LG텔레콤·한솔PCS)을 화나게 했다.
011에 가입한 김규리는 지하 카페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나, 그렇지 않은 김진 핸드폰은 불통이다. 핸드폰 안테나를 조금씩 뽑아내니 맨홀 뚜껑을 뚫고 땅 위까지 올라온다. 70년대 펄시스터즈 히트 가요 ‘왜 그랬을까’를 편곡한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가사는 타사(PCS) 제품보다 우월한 셀룰러를 과시한 비교 광고였다. 이 광고는 당시 PCS 사업자의 아픈 곳을 건드렸고 SK텔레콤은 가입자를 늘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헐뜯는 태도나 지나친 자랑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통신 업계 고위 관계자는 “5G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한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상대를 흠집 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통신 3사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G 기반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5G는 로봇이든, 제조업이든, VR·AR 같은 미디어 산업이든 지금과 다른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네이버 선행 기술 연구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의 석상옥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로보틱스에서 5G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 로봇엔 자체 브레인이 있었지만 이제 5G를 이용하면 클라우드를 대뇌로 쓸 수 있다”며 “로봇 서비스의 대중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G 시대에 네이버가 나왔고, 4G(LTE) 시대에 카카오가 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이 됐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쟁탈전에 파묻히지 않고, 5G 시대 스타 기업의 탄생을 도와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힐 순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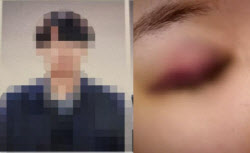



![[포토]고생했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524t.jpg)
![[포토] 걷고 싶은 거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206t.jpg)
![[포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69t.jpg)
![[포토]1400원 뚫은 원-달러 환율…외환당국 '적극개입' 시그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21t.jpg)
![[포토]송길영 작가 "지상파를 역전한 넷플릭스" 기조강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082t.jpg)
![[포토]외규장각 의궤 전용 전시실 일반에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057t.jpg)
![[포토]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713t.jpg)
![[포토] 2025학년도 수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625t.jpg)
![[포토]벼랑 끝에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728t.jpg)
![[포토]유상임 과기정토부 장관, 통신사 CEO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57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