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부터 거창한 장악전략은 없었다. 하지만 두 조직은 기존 거대권력을 헤집고 생태계를 바꿔놨다는 점에서 우위에 섰다. 권력이동의 결정적 현장을 연출한 셈이다. 정치적 파워게임으로서의 권력쟁취는 여기에 없다. 경쟁 격화로 시장서 어떤 자원에 대한 통제가 더 중요해지거나, 공권력의 장벽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도드라지거나,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쉽게 하는 신기술이 부상할 뿐.
이 과정을 단순하지만 압축적으로 드러낸 말이 있다. ‘권력의 종말’이다. 한 마디로 우리가 알던 그 권력이 우리가 알던 그대로 작동하질 않는다는 뜻이다. 모이제스 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최고연구원이 내놓은 이 핵심어에는 정치·경제·금융·미디어 등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지배권력과 ‘미시권력’의 권력투쟁 장면이 다 들어 있다. 중심에서 밀렸던 비주류가 주류를 위협하고 신지배층으로 떠오른다. 이동도 한 방향이 아니다. 완력에서 두뇌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뚱뚱한 기업에서 날렵한 벤처로, 독재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방위로 튄다’.
서른여섯 살이던 1989년 베네수엘라 무역산업부 장관이란 파격 임용 이후 세계은행의 요직까지 두루 거친, ‘진정한 권력자’이던 저자의 역설인지라 양 갈래로 읽힌다. 권력의 무상이냐 권력의 혁신이냐. “권력은 지금껏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중이다.” 결국 답은 이 열쇠문장의 행간에 있다.
▲권력 붕괴 세 요소…양적증가·이동·의식
왜? 혁명적 변화 때문이다. 인구가 늘고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양적 증가’, 노동력·제품은 물론 가치까지 빠르게 옮겨가는 ‘이동’, 이로 인해 나도 권력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의식’이 그것이다. 게다가 양적증가는 권력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동은 권력의 벽을 뛰어넘으며, 의식은 권력의 틈새를 공략해댄다.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차라리 승강기에서 내리시지요”
권력구조 다극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됐다. 개인과 작은 세력이 새로운 지배력을 꾸릴 수도 있으니. 가령 미국의 버드와이저를 인수해 세계를 제패한 브라질·벨기에의 복합기업인 앤호이저부시인베브, 오히려 가벼워서 거침없는 비정부기구(NGO)도 권력의 주체란 말이다.
▲‘권력 쇠퇴’ 긍정의 신호냐 부정의 신호냐
그렇다면 ‘쇠퇴하는 권력’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저자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강고한 지배세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사회는 자유로워지고 정치는 민주적이 되며 소비가 다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 약점도 있다. 정부의 통치력이 무력화된다면 사회의 무질서는 곧 따라붙는 옵션이 될 터. 격렬한 가격싸움이 붙으면 산업을 통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도 해법은 미시권력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거대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범위를 축소할 순 있다. 다만 목적이 패권이 된다면 곤란하다. 무엇보다 ‘내가 주체’라고 말하게 된 그들 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란다.
올해 초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추천하면서 국내선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됐다. 주커버그는 “전통적으로 정부·군대 같은 거대조직만 가졌던 권력이 개인에게 어떻게 옮겨가는지 탐색했다”란 평을 달았지만, 사실은 좀더 전투적이다. 저자의 관심은 이미 권력개념이 쇠퇴한 ‘새로운 권력세계’로 이동한 뒤다. 그러니 장차 어떤 권력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알아내려 애쓰는 일은 헛수고가 된다.
국가나 도시, 산업과 기업, 정치나 경제지도자가 득세하고 몰락하는지에만 촉각을 세우는 권력강박증부터 내다버리라는 조언도 보인다. ‘권력의 허망함’이란 의미로 밀어붙일 건 아닐 텐데. 사실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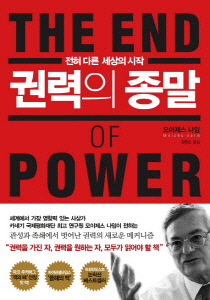






![[포토]양 극단의 집회로 마비된 한남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500313t.jpg)
![[포토]서울 설경을 휴대폰에 담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500239t.jpg)
![[포토]기름값 12주 연속 상승, 국제유가-환율 인상 영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500220t.jpg)
![[포토] 평창송어 얼음낚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1047t.jpg)
![[포토]윤 대통령 체포 실패하고 이동하는 공수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843t.jpg)
![[포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711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591t.jpg)
![[포토]공수처 도착한 오동운 공수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320t.jpg)
![[포토]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 관저 정문 통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246t.jpg)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 강제 해산하는 경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1153t.jpg)

![[포토] 메디힐 골프단 '최정상급 수준의 계약으로 최강 골프단 등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300073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