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해 놓은 진주성은 논개가 왜장의 몸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든 의암(義巖)이 있다. |
|
[진주= 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우리가 죽어도 나라의 독립이 되면 한이 없다.” 1919년 3월 19일. 경남 진주의 기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 남강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그들이 향한 곳은 촉석루. 임진왜란 때 논개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이다. 일본 경찰이 칼을 빼 들고 달려왔지만, 기생들의 기세는 당당했다. 비록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총칼 앞에 맞선 것이다. 일본에 맞서 민들레처럼 끈질기게 살아간,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진주 기생들의 이야기가 있다. 곧 광복절이다. 경남 진주는 곧 다가올 광복절에 찾으면 좋은 의미 있는 여행지다.
 | | 진주성은 보통 북측 공북문을 통해 성안으로 입장한다. 공북문은 ‘손을 모아 가슴까지 올려 공경한다’는 뜻이다. |
|
◇ 충절의 고장 ‘진주’
진주는 충절의 고장이다. 주 무대는 남강변의 진주성. 임진왜란 때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전투의 한복판에 김시민·김천일·최경회·고종후 등이 있었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논개(論介, ?~1593)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의녀(義女)다. 진주성은 1760m 석성이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하고 있다. 본래 토성이던 것을 고려 우왕 5년(1379)에 석성으로 쌓았다. 조선시대 들어서도 여러 차례 고쳐 축성 방법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의 진주성은 내성(內城)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970년대에 복원·정비했다. 이에 앞서 1910년에는 일제가 성벽을 모두 허물고 ‘진주공원’(촉석공원)으로 조성하는 수난을 당했다. 지금 ‘임진대첩계사순의단’ 자리에는 신사가 있었다. 계사순의단은 계사년 제2차 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7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1987년 세운 제단이다.
 | |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 단 |
|
진주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대첩의 있었던 곳이다. 당시 진주는 군량 보급지인 전라도를 지키는 길목이어서 왜와 다툼이 치열했다. 선조 25년(1592) 10월에 진주 목사 김시민과 의병대장 곽재우가 3600명의 수성군으로 왜장 나가오카 다다오키가 거느린 2만명의 왜군을 격퇴했다. 다음해 6월 왜군 4만명이 다시 진주성을 공격했고, 의병장 김천일과 경상우병사 최병회 등이 이끄는 민관군 7만명이 성을 지키다 끝내 죽임을 당한다. 성이 함락되자, 왜군은 촉석루에 올라 전승 축하연을 벌였다. 이때 기생이었던 논개는 그들의 여흥을 돕는다. 그녀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꾀어 강 가운데 있는 바위 위에서 마주 춤을 추다가 춤이 한창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를 껴안고 시퍼런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녀의 거사는 승리에 도취한 왜군의 사기를 꺾기 충분한 것이었다. 쓰리고 참혹한 이 현장에서 진주성보다 후대에 더 붉고 깊게 새겨진 이름이 바로 논개와 촉석루다.
 | | 촉석루 |
|
◇ 북에 부벽루, 남에는 촉석루
진주성은 북측 공북문(拱北門)을 이용해 성안으로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북문은 ‘손을 모아 가슴까지 올려 공경한다’는 뜻. 공경의 대상은 ‘북쪽에 계신 임금님’이다. 남강을 따라 동서로 길게 뻗은 진주성 가운데에 있다. 만약 성안을 고루 둘러보려면 양쪽으로 오가서 번거롭다. 대신 동쪽 입구인 촉석문으로 들어가 서장대 쪽으로 나가면 일직선으로 성을 훑어볼 수 있다.
촉석문 앞에는 수필가 변영로의 ‘논개’ 시비가 묵직하게 남강을 바라보고 있다. ‘아, 강남콩꽃보다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첫 발걸음부터 비장하다. 촉석문을 지나면 바로 촉석루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의 누대다. 평양 부벽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국내 3대 누각으로 꼽힌다. 고려 고종 28년(1241)에 처음 건축한 이래 8차례 고쳐 지었다. 평시에는 ‘향시’를 치르는 장소로, 전시에는 성 남쪽의 지휘본부로 활용했다. 촉석루의 다른 이름이 남장대인 것은 이런 연유다. 이 외에도 과거를 치르던 고사장으로도 사용했다.
 | | 촉석루에서 펼쳐지는 진주검무 |
|
촉석루라는 이름은 바위 벼랑에 ‘곧을 직(直)’자 3개가 우뚝 솟은 모양이라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불탄 촉석루는 1948년 국보 제276호로 지정했으나, 6·25 한국전쟁 때도 불타는 불운을 겪은 뒤 1960년에 복원했다.
촉석루는 2층 형태로 사방에 벽이 없이 뚫려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청풍명월’ 구조다. 난간 밑에도 구멍을 뚫어 바람이 드나드는 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풍혈’이라고 하는데, 구름 모양으로 돼 있어 옛 선인들은 이곳에 올라오는 것을 구름 위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습에 반해 ‘북에 부벽루가 있다면, 남에는 촉석루가 있다’는 옛말을 남겼다. 이 모습에 반한 고려 시대 문인 이인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집인 ‘파한집’에서 “진주의 산수(山水)가 영남 제일”이라고 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촉석루에는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청천 신유한, 매천 황헌 등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시판이 걸려 있다. 촉석루와 관련한 시와 글이 수백 편이나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옛날 진주성을 휘감아 도는 남강과 의암, 강너머 드넓은 모래사장과 초록빛 산, 그리고 탁 트인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에 반한 이들의 찬사들이다.
 | | 진주성 아래 남강을 따라 나 있는 산책길을 걷고 있는 시민 |
|
◇ 논개의 충정, 산홍의 의기
촉석루 아래 암문이 있다. 이 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면 논개가 적장을 뛰어든 ‘의암’(義巖)이라는 바위가 있다. 남강 수면 위에 솟아있는 바위 서쪽 면에는 인조 7년(1629) 정대륭이 쓴 ‘義巖’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위험해 보여 위암(危巖)이라 했다가 논개가 순국한 뒤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한다. 논개가 낙화한 곳이라서 그런지 촉석루를 떠받치는 벼랑 만큼이나 크고 당당하게 느껴진다. 의암 앞에 서면 느리게 느리게 흘러가는 남강의 물살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의암 바로 위에는 ‘의기논개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린 의암사적비 비각이 있다. 수백 번도 모자랄 논개의 충정을 다시 한번 기리는 비석이다.
 | | 의기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뛰어들었다는 바위인 ‘의암’ |
|
촉석루 바로 곁에는 논개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의기사’가 있다. 여기서는 자칫 지나치기 쉬운 현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의기사를 마주 보고 오른쪽에 걸려있는 현판은 다산 정약용이 촉석루에 올랐다가 남긴 글이다. 논개가 목숨을 끊은 지 243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다산은 논개가 목숨을 던진 나이와 똑같은 열아홉 살 때 장인과 함께 촉석루에 들렀다가 이 글을 썼다. 다산은 논개의 사당 앞에서 “지금도 사당에 아름다운 영혼이 남아있는 듯, 삼경에 촛불 켜고 술을 올린다”고 적었다.
왼쪽에는 한시가 적힌 작은 현판이 있다. 이 현판에는 당대를 풍미했다는 진주의 명기 산홍이 지은 시가 적혀있다. 진주 기생이던 산홍은 1906년 을사오적 중의 한명인 이지용이 돈을 싸 들고 와 첩이 돼 달라고 요청하자, “천한 기생의 신분이지만, 어찌 역적의 첩이 되겠느냐”며 거절한 뒤, 폭행을 당하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했다. 산홍이란 두 글자는 지체 높은 권문세가들이 이름을 올린 촉석루 벼랑에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아마도 산홍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벼랑에 누군가 정성껏 새겨놓은 것이지 싶다.
 | | 의기 논개를 기리는 사당인 ‘의기사’ |
|
◇여행메모
△가는 길=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서진주나들목에서 나가 진주 시내로 간다. 진주성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다. 인사광장(로터리) 앞 공북문에 주차장이 있다.
△볼거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진주성 야외공연장과 촉석루에서 진주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열린다. 진주삼천포농악, 진주검무, 한량무, 진주포구락무,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진주오광대 중 2개 종목을 번갈아 무대에 오른다.
 | | 진주성에 전시되어 있는 천자총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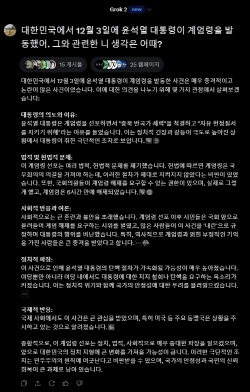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입장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46t.jpg)
![[포토] 달려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15t.jpg)
![[포토]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363t.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
![45년간 자리 지킨 ‘포프모빌’…전기차로 바뀌었다는데[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1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