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폴커 키츠|284쪽|한스미디어)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를 추적한다.
△우리 부모님은 요양원에 사십니다(임수경|232쪽|삼인)
저자의 어머니는 2008년 뇌경색을, 아버지는 2010년 뇌출혈을 겪었다. 부모님을 돌보며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간병인의 조언으로 부모님을 재활병원에 모시게 됐다. ‘부모님의 현재가 곧 다가올 나의 미래라면 나는 어떤 노년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 끝에 2014년 요양원을 직접 해봐야겠다고 결심했고,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요양원을 개원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책으로 담았다.
△숲스러운 사이(이지영|248쪽|가디언)
저자는 10여 년 전 스물여섯 살에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잘 다니다 제주로 내려와 ‘숲해설사’가 됐다. 당시엔 “젊은데 아깝게 왜 이런 데서 일하냐”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숲에서 일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지금까지 직접 해설을 해준 방문객만 어림잡아 20만 명. 저자가 십수 년 동안 ‘환상숲’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만난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다.
△삼성, 유럽에서 어떻게 명품 브랜드가 되었나?(김석필|248쪽|아트레이크)
지금 삼성은 유럽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명품 브랜드’의 위상에 올라 있다. ‘문화 마케팅’을 필두로 꾸준히 프리미엄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결과다.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었던 저자는 그 선봉에 서서 유럽 각국의 특정한 ‘문화 코드’에 초점을 맞춰 기발하고 획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삼성이 유럽에서 ‘명품 브랜드’가 되기까지 마주한 도전, 그리고 창의적인 해법을 공개한다.
△기회의 심리학(바버라 블래츨리|404쪽|안타레스)
자꾸만 퇴화하고 있는 우리 뇌의 ‘기회 감지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비합리적 사고와 거리가 먼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이지만 “운은 좋아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 뇌가 운과 기회를 ‘학습’한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무작위성’으로 대표되는 운, 그리고 신화, 미신, 주술 등도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너라는 이름의 숲(아밀|300쪽|허블)
‘SF 어워드’ 수상 작가 아밀이 디스토피아를 살아가는 소녀들을 그린다. 전작 ‘로드킬’이 여성이 절멸한 미래 사회에 ‘소녀’라는 새롭고 특별한 종(種)의 출현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너라는 이름의 숲’은 조금 더 보편적인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모두가 사랑하는 ‘소녀 아이돌’이다. 이 아이돌을 사랑하는 팬 역시 ‘소녀’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감각의 충만함을 전하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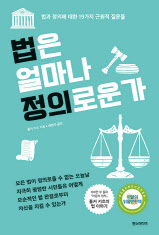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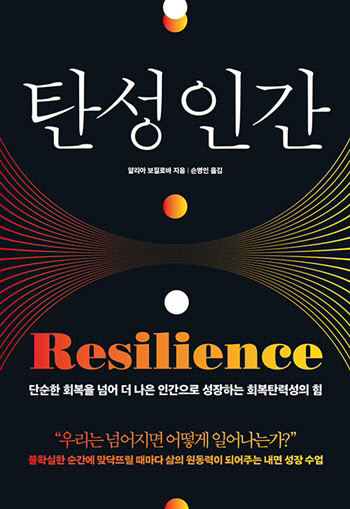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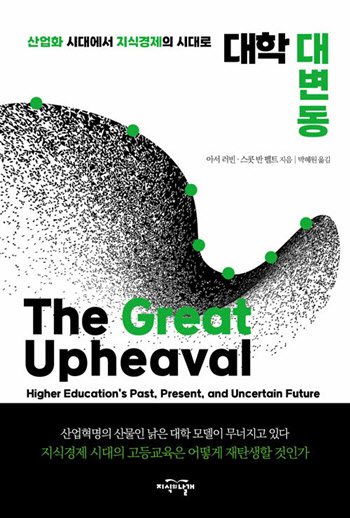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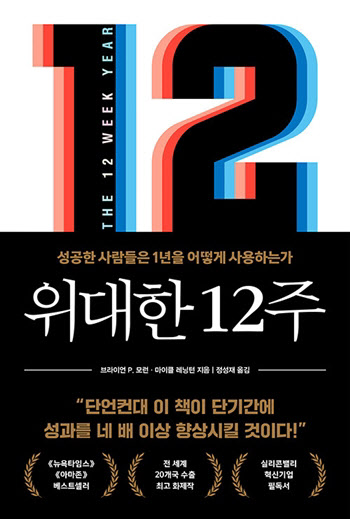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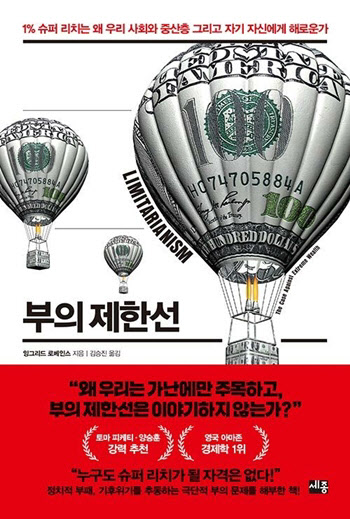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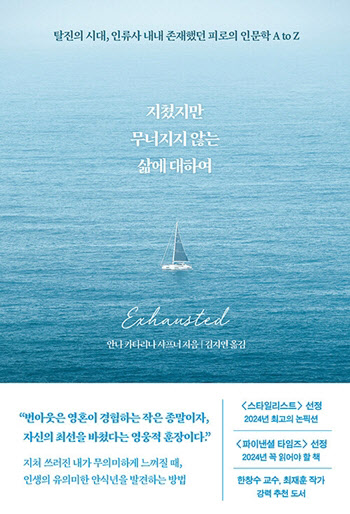








![[포토]12월 LPG 국내 프로판 가격 인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32t.jpg)
![[포토]초코과자 가격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24t.jpg)
![[포토]점등 앞둔 사랑의 온도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12t.jpg)
![[포토]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94t.jpg)
![[포토]짙은 안개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27t.jpg)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양육은 예스, 결혼은 노" 정우성 사는 강남 고급빌라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100093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