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은 점점 살기가 나아진다는데 어째서 가난한 사람은 줄지를 않는가. GDP 총액만 따져도 1950년대 4조달러가 2012년 70조달러로까지 늘어났다고 하지 않는가. 인도만 봐도 그렇다. 12억 3600만명. 인구수로 세계 2위에 등극한 인도의 최근 GDP 증가율은 놀랍기만 하다. 10여년간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니. 그런데 이들 중 3분의 2가 하루 2달러로 생존하고 있다면. 결국 1인당 GDP란 건 극단적인 빈곤에 놓인 사람에겐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단순산술로도 이 논리는 뻔하다. 가령 빌 게이츠의 연소득이 10억달러라고 하자. 빌 존이라는 어떤 남자의 연평균은 400달러. 이때 두 사람의 1인당 GDP는 5억 200달러가 아닌가.
빈곤을 퇴치하자는 건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역사상 어느 대단한 인물도 이룰 수 없었던 허망한 꿈이었단 얘기다. 그런데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 이른바 ‘신의 영역’인 가난잡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까지 말한다.
빈곤퇴치운동가로 맹활약 중인 폴 폴락과 재정전문가 맬 워윅. 책은 이들이 만나 펼친 ‘가난박멸’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다. 무조건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서다. 오히려 냉소적이다. ‘동정심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고 ‘비영리단체가 죽자고 매달려봤자 결과는 뻔하다’고도 역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답은 비즈니스다. 가난을 없애는 결정적인 조건이자 단 하나의 해결책이라 했다.
▲“가난, 비즈니스로만 해결돼”
저자들은 가난이 유엔·세계은행·NGO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야 해결된다고 절대 장담하지 않는다. 아니, 아예 해결영역에서 배제한다. 기댈 건 민간부문뿐. 신흥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최초 타깃을 하루 2000원 생활자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기업의 성패 90% 시장에 달려
“소외된 90%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기업이라도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 책의 권고이자 경고다. 부유한 10%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는 이미 끝났다고 봤다. 압도적 다수인 90%가 이젠 막강한 고객이 될 수 있는 시점이란 거다. 다만 조건이 있다. 기존 지식과 선입견을 내다버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난 뒤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끌어낸 개념이 ‘제로베이스 설계’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적정기술이란 것. 예컨대 ‘큐드럼’이란 물건이 있다. 바퀴모양으로 생긴 이동이 편리한 물통. 물론 단조롭고 세련되지 못한 형태인 건 맞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있는 아프리카 소외지역에선 대단히 유용하게 쓰인다. 바로 적정기술이다.
▲가난구제와 기업흥패는 ‘같은 배’
이제 남은 고민은 하나. ‘어떻게 수십억명을 비즈니스의 고객으로 삼을 건가’다. 최우선 과제는 비즈니스에 대한 발상을 바꾸는 일이다. 비즈니스란 게 산업혁명 이후 줄창 가난한 사람을 더욱 뒤처지게 한 요인이었다는 통념서 벗어나란 얘기다. 한 마디로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것’과 ‘빵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을 구분하자는 거다. 비즈니스가 성립되면 ‘빵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걱정은 없다. 게다가 이 맥락에서 가난구제와 기업흥망은 ‘같은 배’다. 이 배 위에선 무조건 싼 제품이 팔릴 거란 생각도 금물이다. 가난한 이들에겐 작은 물건 하나가 절실하다. 그러니 제품의 브랜드와 평판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저자 중 폴락은 미국의 한 시사잡지가 뽑은 ‘전 세계 용감한 사상가’ 27명에 속했다. 덕분에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등과 동일선상에 섰다. 그래도 잡스와 오바마가 갖지 못한 용감함이 있으니 ‘당신의 가난에 이의가 있다’고 외친, 그 목소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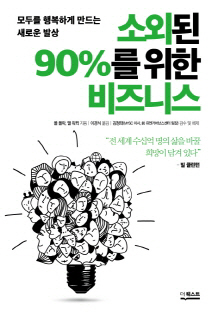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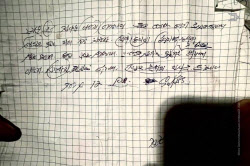




![[포토]크리스마스엔 스케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45t.jpg)
![[포토]37번째 거리 성탄예배 열려 방한복·도시락으로 사랑 나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31t.jpg)
![[포토]조국혁신당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19t.jpg)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50032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