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런 극한사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도 메르스의 확산으로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해다툼 양상으로 치닫는 정국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결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안이 그동안 위헌 시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이 행정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고 위헌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헌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자체로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도대체 왜 이토록 아리송한 법을 통과시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개정안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이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놓고 위헌 논란에 명확한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고심의 선택이라 여겨진다. 여야의 추가 타협으로 조정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야 간에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한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권 지도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법안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직도 각 상임위에는 처리가 미뤄진 채 먼지가 쌓인 경제회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회피다. 박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가 이러한 행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권유하는 따끔한 경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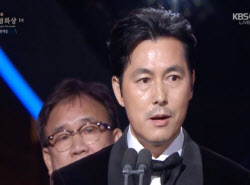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6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