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키도 가늠할 수 없는 노란 풀대가 찌를듯 솟았다. 한 치도 내디딜 수 없게 막아섰다. 여기가 어딘지 구분조차 안 된다. 그저 ‘색’만 보인다. 노랗게 변해가는 시간만 보인다. 저들도 한때는 초록의 절정기를 보냈을 터. 작가 김지선(34)이 마주했던 공간 그 어디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작가가 ‘그곳’에서 얻어내려는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캔버스 작업 전 특정 공간에서 며칠간 일기처럼 사운드를 녹음하고, 영상·사진을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러곤 밑그림도 없이 공감각적으로 경험한 풍경을 재구성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남았나 보다. 거칠고 굵은 ‘색’이 추상으로 변해버린 ‘시간’을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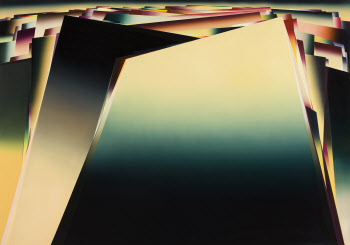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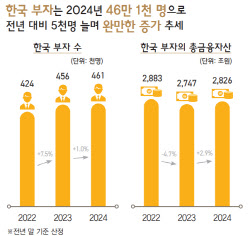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 나인퍼레이드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496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232t.jpg)

![[포토]영화 속 배경에서 찰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369t.jpg)
![[포토] 아수라장된 기자회견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115t.jpg)
![[포토]다양한 식음료가 한 자리에, '컬리 푸드페스타 2024'](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958t.jpg)
![[포토]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743t.jpg)
![[포토]북적이는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708t.jpg)
![[포토] 미소짓는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574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