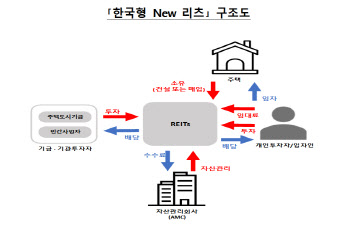| | 작가 최선이 작품 ‘나비’(2018) 앞에 섰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금호미술관 ‘플랫랜드’에 전시한 ‘나비’는 50∼500원짜리만큼의 푸른 잉크를 떨어뜨리고 입으로 숨을 불어내 퍼지게 만든 거대한 작품이다. 두 개 층을 이룬 캔버스의 총길이는 54.84m. 서울·부천·시흥·안산·인천 등 각지의 시민들이 한 숨씩 보탰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직선과 평면만으로 이뤄진 공간이 있다. 2차원 세계. 이곳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한 가지는 ‘정사각형’이 사고를 할 줄 안다는 거다.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조차 의미 없는, 그저 납작한 도형에 불과한 정사각형이 생각을 한다? 여기까지도 신기한데 정사각형이 멀리 3차원 세상에서 온 ‘구’를 만나는 건 어떤가. 점·선·면이 입면체를 이루는 구의 세상이 정사각형에게 먹힐 리 없다. 하지만 정사각형은 구를 따라 3차원은 물론 0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며 결국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인식론을 벗어던진다는데.
134년 전인 1884년 영국인 에드윈 애벗(1838∼1926)이 썼다는 소설 ‘플랫랜드’(Flatland)다. 기록상으론 첫 SF소설이란다. 그런데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출간한 소설이 심심찮게 21세기 최첨단시대에 등장하는데. 수학이든 과학이든 문화든 인간이 새로운 관점·차원·공간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다. 판에 박힌 ‘평면의 나라’에나 있을 법한 제한적인 인식론을 벗어나라는 일침으로 등장하는 거다.
그 연장선상인가. 여기 한 가지가 더 생겼다. ‘틀을 바꿔보라’는 인식의 전환을 권하는 전시 ‘플랫랜드’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금호미술관이 애벗의 동명소설을 타이틀로 펼친 기획전이다. 키워드는 ‘추상’. 지금 시대의 정사각형들에게 납작한 평면에서 나아가 다른 차원을 이해해보자는 제안으로 ‘추상언어’를 빼든 거다.
7인의 작가를 동원했다. 20대 김규호(24), 70대 김용익(71)을 포함해 김진희(43), 박미나(45), 조재영(39), 차승언(44), 최선(45) 작가 등으로 스펙트럼을 넓혔다. 회화·조각·설치·영상 등을 이용해 이미 패턴화한 세상, 또 그 변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포착, ‘추상’으로 다시 드러낸 작업이다. 오래도록 미술이 몰두해온 과제인, 단순히 보이기 위한 ‘재현’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술관의 7개 전시실을 통틀어 30여점을 내놨다.
 | | 조재영의 ‘앨리스의 방’(2017).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뿐인 나무·판지를 세우고 쌓아 일상의 사물이 가진 추상성에 주목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탑골공원·시장·학교…숨결을 모으다
벽으로 끌어올린 퍼런 밭이라고 할까. 벽면을 휘감은 거대한 캔버스에 푸른 잉크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다. 발에 물감을 묻힌 새가 총총거린 것 같기도 하고, 물감을 묻힌 붓이 제 몸을 휘저어 흐트러뜨린 흔적 같기도 하다.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 납작한 2차원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다. “숨을 불어 만든 거다. 50∼500원짜리만큼의 푸른 잉크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입으로 불어 퍼지게 만들었다.”
최선 작가가 작업한 ‘나비’(2014∼2017)란 작품. 주도는 작가가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동작품이다. 서울·부천·시흥·안산·인천 등 각지의 시민들이 한 숨씩 보태 만든 작품이니까. 이른바 ‘참여형 아카이빙 프로젝트’인 셈이다. 캔버스의 총길이는 54.84m. 160㎝×914㎝짜리 6점을 2개 층으로 붙여 전시장을 꾸몄다.
시작은 2014년이란다. 세월호 참사 직후 아시아예술축전에 참석차 안산중앙시장을 찾은 게 계기가 됐다. 푸른 잉크를 떨구고 외국인노동자와 안산시민이 모여 숨을 불어넣은 게 처음. 손바닥만 한 길이 생겼다. ‘숨을 시각화할 수 없을까, 숨 쉬는 일을 보이게 할 수 없을까’ 했던 고민이 성과를 낸 거다. 초월적 의미의 색상이라고 할 ‘울트라마린 블루’를 선택한 것도 그 맥락. ‘수많은 숨결을 모으니 예술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구나.’ 이후 캔버스를 말아 들고 찾아다닌 곳이 늘어났다. 탑골공원으로 시장으로 학교로. 날숨을 위해선 깊은 들숨이 필수. 그렇게 들이마신 숨을 모아 강렬하게 내뱉어낼 ‘마지막 숨 모으기 프로젝트’도 생각해뒀다. 남북한 사람들의 숨을 모으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숨을 뒤섞어 놓으면 어디가 남이고 북인지 구분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들의 숨결을 한데 불어넣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 | 차승언의 ‘천막-7’(왼쪽)과 ‘한 가지-1(등산복 123)’(2018). 섬유를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가 베틀질로 다시 직조한 작품이다. 동대문시장에서 공수했다는 천막을 이용해 도시와 삶의 흔적이 된 패턴·무늬를 단면화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누구는 들숨과 날숨의 조화로 입체화한 추상회화를 이뤄냈다지만, 씨실과 날실의 짜임으로 회화를 넘어선 추상공예를 이끌어낸 이도 있다. 차승언 작가의 ‘천막-7’ ‘한 가지-1(등산복 123)’(2018) 등이다. 동대문시장에서 떼온 천막을 베틀질로 직조해 흔하디흔한 도시 한복판의 패턴과 무늬를 재창조해냈다.
박미나 작가는 ‘12 컬러’(2018)란 연작으로 기성의 틀에 사로잡힌 한국의 소비·유통구조를 비튼다. 한국의 물감회사가 지정한 12가지 물감세트를 정사각형 캔버스에 칠한 뒤 나란히 붙여둔 건데. 외국과는 달리 한국 물감회사만 그들의 기준으로 10색 혹은 12색을 분류하고, 또 그에 맹목적으로 물들어온 우리의 인식틀에 문제제기를 한 거다. 사회규정·규범을 12가지 색으로 나열해 점잖게 딴죽을 걸었다고 할까.
 | | 박미나의 ‘12 컬러’(2018). 왜 한국에는 12가지 색의 물감세트뿐인가. 작가는 시중에 판매 중인 유화물감세트를 브랜드별로 칠해 자신의 ‘문제제기’를 시각적으로 나열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이외에도 가는 구리선 그물에 전자부품을 연결해 머릿속의 2차원과 현존하는 3차원의 간극을 줄여나간 김진희 작가의 ‘인간의 그릇’(2018), 수많은 코드와 가상의 이야기를 쌓았지만 그저 납작한 시각이미지로만 전달되는 호환성 문제를 지적한 김규호 작가의 ‘잔광’(2018),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뿐인 나무·판지를 세우고 쌓아 일상의 사물이 가진 추상성에 주목한 조재영 작가의 ‘앨리스의 방’(2017) 등이 이제까지와 다른 추상실험을 이어간다.
 | | 김진희의 설치작품 ‘인간의 그릇’(2018).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미시적 요소로 만든 작품이다. 가는 구리선 그물에 라디오·MP3 등의 부품을 붙여 당신이 아는 2차원이 3차원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사진=금호미술관). |
|
 | | 김규호의 ‘잔광’(2018). 그래픽디자이너이자 웹디자이너인 작가는 호환성 문제로 시대의 어긋난 풍경을 내보인다. 수많은 코드와 가상의 이야기를 빚어냈지만 보는 이에겐 납작한 이미지로만 읽힐 뿐이라고(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추상’ 키워드 전시에 ‘추상은 없다’는 작가
전시의 클라이맥스라면 ‘추상’을 키워드로 삼은 기획전에 내놓은 자신의 작품을 추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작가가 아닐까. 동그란 도형을 줄지어 붙여 ‘땡땡이 화가’로 불리는 김용익 작가다. “난 모더니즘의 계보학을 잇는 개념미술을 하고 있을 뿐 추상은 없다고 생각한다”가 그의 주장이다. 그의 ‘유토피아’(2018)는 또 다른 땡땡이의 행렬이다. 흰 벽면에 연필로 그린 땡땡이를 이어가다 캔버스를 만나며 색색의 땡땡이를 연결하는 형태인데. 인간 주체의 생각·번뇌(땡땡이)가 인간(캔버스)과 결합해 비로소 ‘유토피아’를 만난다는 의미란다. 다소 복잡한 듯하지만 그럴 것도 없다. 세상의 그림이 캔버스에 갇혀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납작한 관념을 뛰어넘은 거니까. 평생 고심했다는 ‘회화란 무엇인가’에 결론을 냈다고 할까. 게다가 아무것도 안 그려도 그림이 된다고 여겨 빈 캔버스를 걸어두기도 했는데. 추상은 없다고 한 작가가 선보인 ‘추상의 끝판왕’인 셈이다.
 | | 작가 김용익과 작품 ‘유토피아’(2018). 흰 벽면에 연필로 그린 땡땡이가 캔버스를 만나 색색의 땡땡이를 이어받는 형태다. 인간 주체의 고뇌(땡땡이)가 인간(캔버스)과 결합해 비로소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한자어로 추상(抽象)을 풀면 상을 당겨 빼내는 작업이란 뜻이 된다. 형태를 완전히 이룬 구상(具象)과 다른 점이라면 빼낸 그 상이 불분명하다,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일 텐데. 그런 이유에선지 일상에서 ‘추상적’이랄 땐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차마 구체화할 수 없는 막연한 관념세계를 표현해 온 것이니까. 하지만 어쩌겠나. 세상에는 구체화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으니. 그저 ‘막막한 그림’ 정도에 머물던 추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면 전시의 목적은 달성한 셈. 어찌 됐든 134년 전 정사각형이 느낀 혼란보다야 더하겠나. 전시는 9월 2일까지.
















![[포토]제시 린가드, 'VIP 시사회 출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161t.jpg)
![[포토]서울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121t.jpg)
![[포토]화재진압 훈련하는 종로구 소방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083t.jpg)
![[포토]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019t.jpg)
![[포토]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참석하는 한동훈 당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858t.jpg)
![[포토] 세계최초 8K 온디바이스 AI TV](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97t.jpg)
![[포토]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투명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57t.jpg)
![[포토]패딩이 필요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47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37t.jpg)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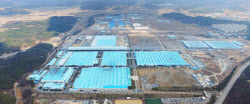
![[포토] 롯데 챔피언십 공식 포토콜 단체사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10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