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한 회사에서 사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말이다. 이꼴 저꼴 보기 싫다고 뛰쳐나와 창업대열에 선뜻 끼지 않았다면 말이다. 칼을 뽑았으면 가보는 게 답이란 결의에 차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 등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중이라면 말이다. 그렇게 덜컥 “나도 한번 CEO?”가 슬그머니 목표가 돼 있다면 말이다.
슬슬 CEO를 만들어낸 ‘신화’에 관심이 가기 시작할 거다. 사실 세상에 떠도는 몇 가지 공식이 있긴 하다. 당장은 이런 거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은수저라도 쥐고 태어날 것, 학력은 물론 경력까지 나무랄 데가 없을 것,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뒷목에 아우라처럼 달고 다닐 것, 상대가 누구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질 것,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 실패라곤 모르는 인생일 것. 어떤가. 아무리 ‘신화’라고 밑밥을 깔았다고 해도 단박에 주눅이 들지 않나. 그런데 말이다. 이런 CEO는 둘째 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기는 한가.
현실을 한번 볼까. 현직 CEO 가운데 70%는 명패가 놓인 나홀로 사무실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 아예 없었단다. 미국의 엘리트코스인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자는 7%에 불과하고, 8%는 대학 졸업장이 없거나 한참 뒤에나 손에 쥐었다고도 했다. 45%는 한 번 이상 크게 실패했으며, 33% 이상은 사람만 보면 도망치고 보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수줍게 밝혔다는 거다.
그래. 인정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얘기다. 하지만 그냥 ‘미국 얘기’로 선을 그어버리기엔 뭔가 아쉽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 뽑아냈다면 분명 쓸 만한 팁이 더 있지 싶은데. 맞다. 뭔가 특이한 게 꿈틀댄다. ‘게놈 프로젝트’다. 한 생물체가 가진 모든 유전정보라는 ‘게놈’을 해독해 유전자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배열을 분석하는 연구작업. 그 방식을 CEO 만들기에도 들이댔다는 거다.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산다는 보통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게다가 야심 찬 명제까지 붙여냈다. “CEO 게놈행동만 터득하면 당신도 CEO가 될 수 있다”고.
|
‘CEO 게놈 프로젝트.’ 바탕은 데이터분석과 인터뷰였다. 리더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역시 리더십 평가문항 1만 7000개를 만들어 일차분석을 끝내고, 그렇게 다시 걸러낸 2600명의 턱 앞에 질문지를 내밀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CEO 게놈 지도 만들기’인데. 다시 말해 CEO를 분석해 CEO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쓸 만한 길찾기를 제공하려 한 거다.
몇 가지 연구성과를 보자.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철석같이 믿는 ‘리더십’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꽤 있다는 건데. 가령 ‘성과가 높은 CEO의 행동’이라면 몇 가지가 잡힐 거다. 신중하고 치밀한 분석력이란 개인적 소양에다가 탁월한 참모를 통한 양질의 의사결정으로 꾸린 외부환경까지. 그런데 막상 까보니 아니더란 거다. ‘과단성’이더라고 했다. ‘이 문제는 내 책임’이란 의식 말이다. 옳은 결정을 내리고 싶어 안달을 부리지도, 질질 끌다가 물이 다 빠진 항구에 배를 들이느라 질척거리지도 않는다. 정확성보단 속도더란 의미다.
영향력 확대를 위한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기저기에 ‘친한 척’만 하다간 상황을 망치기 십상이란 결과도 뽑아냈다.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나가단 해고순위에 이름을 앞세울 수 있어서란다. 왜? 우호적인 CEO의 특징은 갈등회피니까. 이미지 관리하자고 ‘부드러운 접촉’만 외치다간 진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게 될 테니.
그렇다면 이보다 앞서, 이들 리더는 자신들이 ‘과단성을 가진 데다 지나치게 우호적이지도 않은’ 막강한 CEO 후보란 걸 어떻게 부각했나. 이것도 단순치 않다.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보였다는 건데. 키워드 중 하나는 ‘상사’고 다른 하나는 ‘노이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상사를 선택한다’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로 설명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흔히 알려진 ‘엘리트코스’를 역주행했단 거다. 최소한 ‘윗분의 눈에 들어 승승장구 했다더라’ 혹은 ‘한눈팔지 않고 성실히 일만 했더니 길이 보이더라’는 부류는 아니더란 소리다. 자신을 보호해줄 상사를 미리 관찰해 골라보란 얘기고, 심심하지 않게 소란을 일으키는 조직원이 되란 소리니까.
△동네이웃 CEO 만들기 프로젝트
CEO라고 하면 어째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부터 꼽고 보는가. 저자들은 CEO 신화를 향한 고정관념부터 부숴낸다. 선동? 아니다. 신화에서 다큐멘터리로, CEO의 인간극장을 지극히 현실적인 스토리로 다시 편집하자는 시도니까. 덕분에 책은 뻔한 리더십 조항을 들먹이며 상황을 배배 꼬는 미스터리물에선 벗어났다.
일단 CEO만 되면 장땡이다? 이것도 아니다. 실제 CEO 중 25%는 강제로 물러나고, 신임 CEO는 첫 2년 안에 성패가 갈리더란 결과물까지 달아뒀으니. 좋은 유전자로 잘 태어나 죽을 때까지 CEO로 산다는 현실감 제로의 드라마 같은 환상에서 냉큼 벗어나라 이르는 거다. 게다가 평범한 동네 ‘이웃집 출신’으로 CEO 되기를 원한다면.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게놈 행동’이란 것. 책 한 권에 걸쳐 열심히 다져낸 ‘과단성’ ‘영향력 확대를 위한 관계 형성’ ‘엄격한 신뢰성’ ‘주도적 적응’이란 것 역시 아직은 정답 없는 유전자처럼 보이는 거다. 그나마 건진 게 있다면 그 산을 차곡차곡 쌓아갈 훈련과 경험을 강조한 점이라고 할까. 차라리 피부에 척 와서 달라붙는 어느 CEO의 살아남기 전략이라면 어떨까 싶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기에 CEO가 지나치게 높은 자리니, “어려운 대화를 하는 동안 화가 날 것 같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살을 꼬집는다”고 했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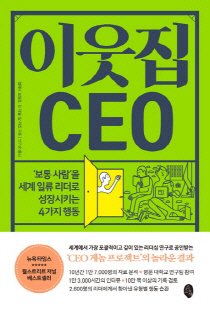





![[포토] 코스피, 코스닥 내림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243t.jpg)
![[포토]'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로 이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58t.jpg)
![[포토] 네스프레소 2025 캠페인 론칭 토크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14t.jpg)
![[포토] '와일드무어' 미디어 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05t.jpg)
![[포토]공수처 차고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 차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861t.jpg)
![[포토]사다리로 차벽 넘는 공수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701t.jpg)
![[포토]공개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422t.jpg)
![[포토]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899t.jpg)
![[포토] 설 명절 자금 방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72t.jpg)
![[포토] 우체국쇼핑 "설 선물 특가로 구매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40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단독]尹 16일 헌재 출석하려 했다…"변론권 보장 못받게 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501489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