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내 이름은 J D 밴스다. 난 서른한 살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지도 못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일은 예일 로스쿨을 졸업한 것. 하지만 매년 그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만 해도 200명이다.”
‘회고록’이라 붙인 타이틀이 미안하다며 운을 뗀 서두는 지극히 평범하다. 처음이라 그러려니 했다면 속은 거다. 예일 로스쿨을 199명의 학우와 함께 졸업해 이제 서른두 살이 된 J D 밴스라는 이는 마지막까지 이 톤으로 척박한 인생을 푼다. 하물며 밥 아저씨, 칩 아저씨, 스티브 아저씨, 맷 아저씨, 친 아버지, 켄 아저씨 등, 어머니의 남자를 따라 6년 동안 6번 거처를 옮기는 대목에서조차 학창시절 이수과목을 소개하듯 덤덤하다.
|
힐빌리(hillbilly)는 두메산골 촌놈이란 뜻. 미국의 백인 하층민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콕 찍어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에 사는 가난한 백인 노동계층을 가리킨다. 깎아내리기 식 표현은 더 있다. 교육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시골사람을 뜻하는 ‘레드넥’(red necks) 혹은 ‘화이트 트래시’(white trash). 힐빌리도 그 언저리다.
책은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미국 오하이오주 철강도시 미들타운에서 태어나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 실리콘트래시밸리로 진출한 변호사 J D 밴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소설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집안에선 어머니가 약물중독에 빠져 있고 아버지 후보군이 근처에 밀집해 있다. 집밖에는 빈곤·폭력·마약·범죄 등이 포진해 있다. 안팎이 지뢰밭이니 위기가 없을 수 없다. 고교 중퇴 고비를 넘긴 건 어찌 보면 천운. 그랬던 그가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서 복무하고 아이비리그에 진출해 변호사가 됐다. 팡파르를 울릴 성공사례 아닌가. 책을 썼다면 ‘안 들춰도 비디오’인 뻔한 신화창조가 될 터.
△트럼프 지지자 된 백인 빈곤층 정서
지난해 미국서 출간한 이후 아마존에만 8400여편의 서평이 쏟아졌단다. 좀 한가했던 누군가 독자평점을 더해봤더니 5만점이 되더라고. 빌 게이츠, 론 하워드를 앞세운 유명인사들이 앞다퉈 추천사를 날리고. 그런데 책 어디를 들춰도 물밀 듯한 감동은 없다. 대신 이것. “통계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는 비참하다. 운이 좋으면 수급자 신세를 면하는 정도, 운이 나쁘면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 나는 아주 멀쩡할 때조차 시한폭탄 같았다.”
처절하지만 드물지는 않은 이런 세상살이가 새삼 부상한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이라서다. 그곳에선 없을 줄 알았던 일, 자신의 삶에서조차 소외당하는 그 일이 생생하게 여과 없이 시신경에 흡수됐기 때문이다. ‘어찌해도 안 되니 이젠 안한다’는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서다. 바로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흑인도 아닌 백인이.
윤리? 처음부터 없었다. 가난? 산소 같은 것 아닌가. 문화? 뭉개진 지 오래다. 가정폭력? 살아남았으면 됐다. 소외? 무슨 사치스러운 소리. 그런데 그 판국에 소위 ‘복지여왕’까지 데리고 산다.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복지혜택을 이용해 사치스럽고 게으르게 사는 백인 말이다. 저자는 특히 그 복지여왕을 향한 백인 노동계층의 혐오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는 의도치 않은 분석틀을 만들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현상 말이다. 굳이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감이었다는 거다.
△힐빌리 내부고발자 “학습된 무기력이 문제”
결말은 만만치 않다. “예일 로스쿨 졸업생이고 변호사협회의 건실한 회원이며 두 달 전 어느 맑은 날 결혼식도 올렸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행복하게 산다”는 저자에게 떨어진 엔딩은 이랬다. “신분상승은 결코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떠난 세상은 자꾸 잡아끌려고 하게 마련”이라고. 어머니가 다시 마약을 시작한 좌절이 만든 잿빛 에필로그다.
힐빌리에서 하버드나 예일에 진학한 사람이 왜 자신밖에 없는지, 감히 물을 수도 없다. ‘냉소가 가히 종교적’이란 힐빌리에 대고 그저 외칠 뿐이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자기 앞길만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빌어먹을 낙오자처럼 살지 말자”고.
강하고 지독한 사람들이 힐빌리에 산다고 했다.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을 찾아 전기톱을 들이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정부’라고 했다. 공공정책이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순 있다. 하지만 자신들을 향해 공공정책을 내미는 정부는 없었다고 일갈한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더란다. 개인 혹은 집단의 삶이란 게 그리 간단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힐빌리 내부고발자의 우울한 노랫가락에 움찔했다면 미래에 볼 법한 또 다른 영화 장면이 보여서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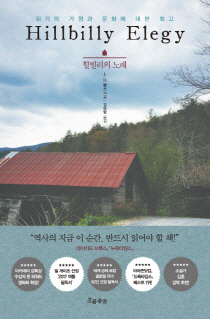






![[포토]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609t.jpg)
![[포토]인사청문회 출석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404t.jpg)
![[포토]아침 영하 10도, 꽁꽁 얼어붙은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843t.jpg)
![[포토]스케이트 타는 시민들로 북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317t.jpg)
![[포토]기름값 10주째 올라…전국 휘발유 평균 1652.2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58t.jpg)
![[포토]크리스마스 분위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48t.jpg)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 나인퍼레이드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496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232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