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사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나쁜 꾀’로 남을 속임”이란 뜻이다. 그런데 여기 좀더 과격한 사기가 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나쁜 피’로 남을 속임.”
시작은 이 한 문장이었다. “집에서 직접 피 한 방울만 뽑으면 수백 가지 건강검사를 할 수 있다.” 어떤가. 대단하지 않은가. 아마 혁명이란 것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다. 세상을 뒤집는 혁신 혹은 변혁, 기성을 초월하는 파격 혹은 쇄신. 다만 피를 부르는 유혈혁명인 건 맞다. 최소한 한 방울은 내놓으라고 하니까. 까짓 이쯤이야. 기꺼이 짜줄 용의가 있다. 게다가 의도가 착하기까지 하니.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저렴하게 질병과 싸워 아픈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하질 않나.
이 엄청난 생각은 젊은, 아니 차라리 어리다 할, 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더욱 엄청난 건 그저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번 던져보고 만 것이 아니었다는 거다. 실제 그이의 스타트업이 ‘파격적이고 착하기까지 한 피 한 방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겨낸 것이었으니까. 미세바늘로 고통 없이 혈액을 채취하는 접착형 패치에서 나온 결과를 주치의에게 전달한다, 누가 이 꿈을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이 모두가 사기였다? 그것도 한때 실리콘밸리의 별이라 불린, 마냥 믿고만 싶었던 젊고 매력적인 여성 창업자가 꾸민 주도면밀한 사기극이라고?
책은 ‘실리콘밸리 사상 최대 사기극’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건의 전말을 폭로한 탐사스토리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그 험한 일을 자처한 이는 저자 존 캐리루. 월스트리트저널 탐사보도 전문 저널리스트다.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는 경력이 따라붙는다.
△실리콘밸리 농락한 ‘나쁜 피’
|
자, 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는 그대로다. 돈이 붙기 시작했다. 미국 최대 잡화·식품·건강보조품 판매업체인 월그린이 투자를 선언했다. 이어 미국 대표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프웨이가 접근했고. 매장만 수천 개에 달하는 이들 기업이 테라노스와 공급계약을 하자고 덤벼든 거다. 결정적으론 미국 군대다. 이 진단법을 여기보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데도 없어 보였다. 하늘을 찌를 듯한 상승세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다.
△대형사기극에는 공식이 있다…돈·권력·언론
현대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아해 했을 법한 지점. 극소량의 혈액으론 의미있는 검사결과를 낼 수 없단다. 아직까진 말이다. 같은 피라 해도 결과가 왔다갔다 할 만큼 불안정하다는 거다. 다시 말해 홈즈의 진단법이란 건 단순히 결과를 뽑아낸다는 차원을 지나 한계를 뛰어넘어야 했단 얘기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 방법은 조작뿐. 검사결과를 포장하고 투자자용 제품시연은 만들어둔 걸로 대체했다. 여기에 극도의 기밀유지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그 드라마에 제동을 건 이가 바로 저자다. 발단은 한 점 의혹이었다. 수년 간 기술 결함을 감추고, 다른 회사의 기기를 몰래 이용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하고, 입단속용 비밀유지서약에 서명하라는 강요까지. 소소한 한 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전 테라노스 직원 60명을 포함해 내부고발자 160여명과 긴밀히 진행한 인터뷰가 바탕이 됐다고 했다.
책은 또 한 편의 사기극을 세상에 꺼내놨다. 흥미로운 캐릭터에 잘 짜인 각본이 살아 있는. 늘 그랬듯 필요충분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단 얘기다. 예나 지금이나 대형사기극에는 나름의 공식이 있으니까. 실제 사기꾼은 자리만 펼칠 뿐, 돈과 권력이 들러붙고 언론이 부추긴다. 조연은 절박한 대중. 간절함이 클수록 격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없이 반복되는 그 공식에 왜 또 속을 수밖에 없나. 독일 나치 선전장관을 지낸 파울 요제프 괴벨스(1897∼1945)의 말은 어쨌든 유효하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잘 속는다’고 했더랬다. 이뿐인가. 신뢰하는 만큼 속고, 욕망이 강해 속고, 불안해서 속고.
15년 만에 10조원 가치를 0원으로 만든 ‘몰락의 드라마’가 어떤 경각심을 일으켰을지 알 수는 없다.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을 거란 것. 다만 하나는 건지고 가자. 세상은 아직도 기술보단 사람이란 것. 내부고발자란 낙인을 마다하지 않은 160명, 온갖 협박과 감시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단 한 명의 기자가 결국 거대한 판을 깨버리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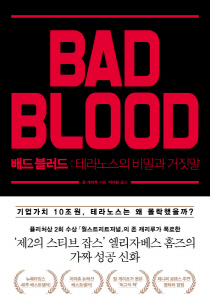






![[포토]명동성당 성탄 대축일 미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76t.jpg)
![[포토]크리스마스엔 스케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45t.jpg)
![[포토]37번째 거리 성탄예배 열려 방한복·도시락으로 사랑 나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31t.jpg)
![[포토]조국혁신당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19t.jpg)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