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은 전 세계의 산업 트렌드로 떠오른 ‘메타버스’와 직결된다. 글로벌 게임사들이 M&A로 다양한 지식재산권(IP) 및 플랫폼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게임은 주요 산업군 중 하나다.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의 매출 규모만 따져도 약 7조 원대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게임사들은모바일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외형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최근 웹툰, 영화, 음악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일각에서 국내 게임사들을 향해 ‘우물 안 개구리’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매번 비슷한 콘텐츠, 비즈니스모델(BM)은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비판받는다.
한 수 아래로 무시했던 중국 업체들의 약진과도 비교된다. 중국 미호요의 ‘원신’의 경우 모바일, PC, 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 출시해 전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거듭났다. 기술력, 작품성 등에서 K-게임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국내 게임사들로선 뼈 아픈 대목이다. 지금은 텐센트, 소니, MS 등 글로벌 3대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다. 장르와 콘텐츠는 물론 플랫폼간 영역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외연을 넓히고 유연성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내수에만 목매지 말고, 북미·유럽 시장의 수요도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 캐쥬얼한 모바일 게임 중심의 현 개발 흐름에서 벗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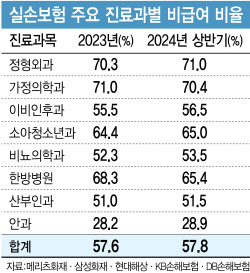




![[포토] 소방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 불 신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60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14t.jpg)
![[포토]의협 대의원총회 참석하는 임현택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95t.jpg)
![[포토]잠시 쉬어가는 서울야외도서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81t.jpg)
![[포토]‘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59t.jpg)
![[포토]정부, ‘비위 혐의 다수 발견’ 이기흥 체육회장 등 경찰 수사 의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27t.jpg)
![[포토]수능대박을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02t.jpg)
![[포토]가을의 추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165t.jpg)
![[포토]이보미,오랜만에 쉽지않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900387t.jpg)
![[포토] 이대한 '오늘 홀인원 한 볼입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900174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000314h.jpg)
![돌아온 현대트랜시스 노조, '미래' 내다볼 때[기자수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100028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