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냈던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집무실 이전 장소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수정했다. 경호·안보를 비롯해 비용, 통신 문제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공약을 어긴다는 지적을 들으면서까지, 윤 당선인은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는 소신을 지키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전날(19일)에도 본인이 직접 용산 국방부 청사에 현장 답사를 다녀갈 정도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현 정권이 기꺼이 협조해줄 것이라고 관측했던 만큼, 청와대의 공개적인 제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결국,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며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다. 국정과 정치 협력은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집권 5년 내내 통의동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도 국민 여러분과 가급적 같이 공유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들어갈 시점이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취임식도 하지 않은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기에서 밀리면 집권 초부터 완전히 밀린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해지면서, 나아가 임기 내내 리더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방부 앞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거나 통의동 집무실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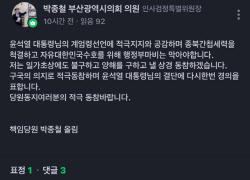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포토] 대통령실 입구의 취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817t.jpg)
![[포토]'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571t.jpg)
![[포토]'긴박했던 흔적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485t.jpg)
![[포토]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탄핵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366t.jpg)
![[포토]尹, '비상 계엄 해제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277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90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