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기를 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결국 싸움을 법정으로 끌고갔다.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3대 주주 엘리엇은 그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내달 17일 열리도록 돼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엘리엇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외국인 및 소액주주 지분을 결집해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합병안을 둘러싼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에 있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그룹 계열사, KCC 등 우호세력까지 포함한 지분이 19.78%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34.1%에 이른다.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손을 잡아 합병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차근차근 경영승계를 준비해온 이재용 체제로서는 결정적인 타격이다.
이번 소송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엘리엇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어딘지 석연치 않다. 약 29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무기로 아르헨티나 부실 국채를 인수한 뒤 아르헨티나 정부에 소송을 걸어 2001년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뜨렸으며, 이에 앞서 1996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페루를 곤경에 빠트리는 등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사냥감으로 삼아 지분을 확보한 후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가 고점에 이르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먹튀’ 행보나 다름없다. 시중에서 엘리엇을 ‘벌처펀드’의 하나로 간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국은 2003년 SK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1조원가량을 쏟아붓고서야 회사를 겨우 지켰던 위기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위협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와 같은 기업경영권 보호수단을 도입해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포토] 오세훈 시장과 김병주 MBK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60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47t.jpg)
![[포토]SK AI 서밋 부스 살펴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862t.jpg)
![[포토]수능 D-10](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794t.jpg)
![[포토]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세레모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83t.jpg)
![[포토]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참석한 김병환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29t.jpg)
![[포토]검찰, 류광진 티몬 대표 소환 조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19t.jpg)
![[포토] 이동민 '우승트로피 번쩍 들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177t.jpg)
![[포토]'덕수궁의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295t.jpg)

![[포토]마다솜,빛나는 트로피와 금메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34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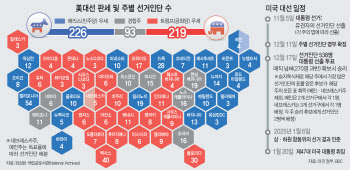
![[단독]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043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