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서울이 잠기면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는 반지하 멸실 정책만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 |
|
주거용 지하·반지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약 32만7000가구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31만4000여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지하는 ‘저렴한 집’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집’의 다른 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하주거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187만원이다.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4.7% 52.9%에 이른다.
최근 서울 지역에 떨어진 ‘물 폭탄’으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없앨 방침이다. 주거 취약 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반지하가 사라지면 저소득층 등은 당장 머물 곳이 없어질 수 있단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조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려면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에서라도 행정구역 내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반지하를 없애면 거리로 나오는 많은 서민은 다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있다. 서울 강남구의 반지하에 거주하는 A(30)씨는 “반지하에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이 되는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다”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반지하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 너무 졸속으로 나온 극단적인 대책”이라 지적했다.
전문가는 반지하를 일괄 없애는 정책만으론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거급여 복지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월세 등 집값이 너무 높아 주거급여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를 100%, 80%, 60% 등으로 월세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이는 것은 옳지만, 주거 복지가 병행돼야 한다. 반지하를 멸실하겠다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주거 형태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무조건 반지하는 없애는 정책은 저렴한 임대료 시장에 재고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다”며 “반지하를 없애는 것보다는 주거 안전에 초점을 두고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태에서 차수벽 설치나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반지하 주택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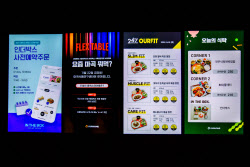






![[포토]축사하는 이상원 양형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200974t.jpg)
![[포토] 농가희망봉사단, 마을회관 기증품 전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200740t.jpg)
![[포토]축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200598t.jpg)
![[포토]오언석 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263t.jpg)
![[포토]지드래곤, 출국](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253t.jpg)
![[포토]이력서 작성하는 어르신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012t.jpg)
![[포토]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장에서 시위하는 조합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008t.jpg)
![[포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0813t.jpg)
![[포토]]인사 나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동연 경기지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0709t.jpg)

!['드림카'로 즐기는 한밤의 드라이브…강민경의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300115h.jpg)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가 광화문역에 걸린 이유는[파도타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30016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