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과 2차 팬데믹 탓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이같은 실업난이 정치권의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6.9%로 전월(7.9%) 대비 1.0%포인트 내렸다.
미국 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월만 해도 3.5%였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3월 4.4%로 상승했고,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간 4월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4.7%까지 폭등했다. 그 이후 13.3%→11.1%→10.2%→8.4%→7.9%로 점차 내렸고, 지난달에는 6%대까지 낮아졌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오일쇼크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실업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CNBC는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국의 일자리는 1000만개 증발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업 통계가 중요한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락한 실업률을 언급하면서 “부양책으로 3조달러를 투입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가 적절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부양책 규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작은 규모의 부양책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상 최대를 기록한 코로나19 감염자를 거론하며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타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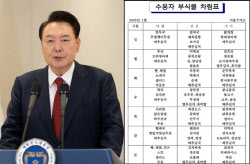



![[포토]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591t.jpg)
![[포토]공수처 도착한 오동운 공수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320t.jpg)
![[포토]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 관저 정문 통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300246t.jpg)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 강제 해산하는 경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1153t.jpg)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상현-김민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1052t.jpg)
![[포토]2025년 한국 증시 ‘상저하고’…코스피 2398 ‘약보합’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0974t.jpg)
![[포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0781t.jpg)
![[포토] 서울시 직원, 신년 떡국 오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0733t.jpg)
![[포토]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0729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보수단체 회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200668t.jpg)
![[포토] 메디힐 골프단 '최정상급 수준의 계약으로 최강 골프단 등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300073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