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가 시즌7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슈퍼스타K7’은 19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케빈오와 천단비의 결승전을 선보였다. 심사위원 점수에서 다소 앞섰던 천단비를 케빈오가 문자 투표 등 다른 변수로 눌렀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배경이나 훈훈한 외모, 기타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의 면모 등을 비교해 ‘제2의 로이킴’이라 불리며 케빈오의 성공에도 많은 이들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케빈오와 천단비의 맞대결은 여러모로 새로웠다. 해외파와 국내파의 대결이었다. 최초의 남, 녀 성대결이었다. 자작곡과 기성곡의 대결이기도 했다. ‘유튜브 스타’와 ‘코러스 여왕’의 기분 좋은 경쟁이었다. 대중, 관객은 물론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을 수 개월에 걸쳐 지켜본 제작진마저도 우승자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케빈오와 천단비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집계를 아직 내보지 않았는데 어렴풋이 계산하면 ‘1점’ 정도의 한끝 차였다.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심사위원 점수에서 5점 내로 차이가 났고, 문자투표로 케빈오가 뒤집었는데 1점 차의 간발의 차이였던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김기웅 Mnet 국장은 “케빈오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세션이나 음악감독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친구”라고 회상했다. 편곡 실력,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는 감각 모두 새로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대에 대한 진정성에 접근하는 방식이 대단했다.
김 국장은 “준결승전은 케빈오에게 참 특별한 무대였다”며 “그 무대를 계기로 자밀킴과 케빈오의 팽팽했던 구도가 확 달라졌을 것이고 그 결과로 케빈오가 결승에 진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케빈오는 ‘비처럼 음악처럼’을 불렀는데 걱정이 컸다”며 “김현식의 노래를 전에도 선곡한 적이 있었고 한국어 가사를 외우는 일도 시간이 촉박해 힘들 것 같았다”고 돌아봤다.
김 국장은 “그걸 보란듯이 해낸 케빈오를 보면서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했다”며 “케빈오는 우승 타이틀을 거머쥘 자격이 분명 있는 친구였고 지난 시즌 싱어송라이터 우승자였던 곽진언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응원을 보냈다.
케빈오는 20일 우승자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2일 개최되는 ‘2015 MAMA’ 무대에 서는 등 공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슈퍼스타K’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앨범 발매 기회도 잡은만큼 케빈오의 본격적인 ‘한국 생활’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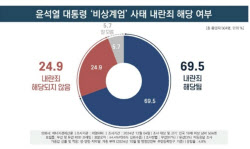




![[포토]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534t.jpg)
![[포토]서울 지하철, '계엄 파문 속' 3년 연속 파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82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79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32t.jpg)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국회 월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332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부산·대구에서도 60% 이상[리얼미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353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