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식이 웃으며 말했다. ‘부산행’ 얘기다. 최우식뿐이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 ‘한국에서 좀비영화라…’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최우식은 영화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섰다.
“아무래도 외국영화에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객들은 이미 좀비영화에 대한 어느 정도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텐데 ‘부산행’이 그것을 극복하고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죠. 결국 쓸데없는 걱정이었지만요.”
‘부산행’은 지난 7일 천만영화에 등극했다. 올해 첫 천만영화다. 한국형 좀비영화의 성공, ‘부산행’의 흥행은 한국영화의 장르를 한 뼘 넓혔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이 불안한 때잖아요. 생존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을 때 석우(공유 분), 상화(마동석 분)보다 먼저 팔에 테이프를 감는 사람이 영국이에요. 그러다가도 좀비로 변한 친구들을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 10대의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최우식의 얘기를 들으며 문득 그의 10대 시절이 궁금했다. 그는 ‘공부를 잘하지도 잘 놀지도 못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들려줬다. 그의 친구들은 ‘평범한 애가 연기를 한다’면서 신기해한다고 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다고도 덧붙였다.
“운이 좋았어요. 좋은 감독님, 좋은 선배님들 만나 덕을 많이 봤어요. 즐겁게 촬영했는데 결과까지 좋으니 행복해요. ‘부산행’ 만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현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인’ 이후 오랜만이었어요. 그 속에서 놀 듯이 편하게 연기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잘하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작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최우식에게 만약을 전제로 ‘부산행2’가 나온다면 또 출연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미 감염돼버려서 출연할 수 있을까요.”(웃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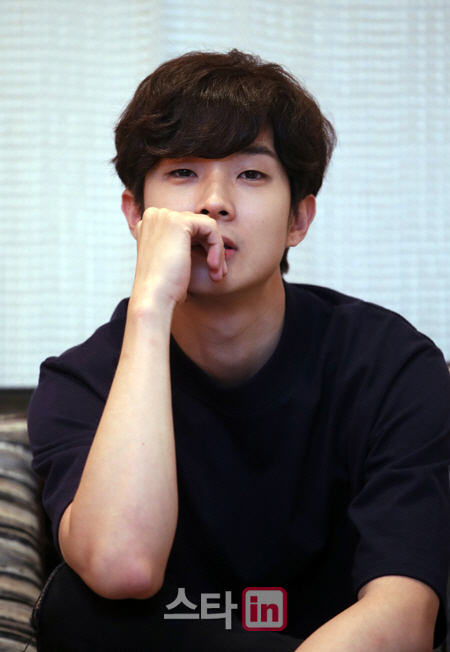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포토] 대통령실 입구의 취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817t.jpg)
![[포토]'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571t.jpg)
![[포토]'긴박했던 흔적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485t.jpg)
![[포토]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탄핵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366t.jpg)
![[포토]尹, '비상 계엄 해제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27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