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고 최소 6개월 이상 활동을 유지하는 데 평균 1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SM·YG 등 몇몇 ‘알짜’ 기획사가 아닌 대부분 중소기획사의 형편은 어렵다. 유통사로부터 일명 ‘선급금’을 받아 가수(앨범)를 제작한다.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수억 원을 쏟아붓는 제작자는 드물다.
멜론, 엠넷 등 유통사는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제작자를 지원한다. 그 이상은 위험 부담을 고려해 꺼린다. 이 선급금이 바닥나는 순간 제작자들의 ‘돈 싸움’이 시작된다. 신인 가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수익이 나기까지 버텨줄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해서다. 중도 포기는 곧 신뢰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수다.
‘대박’이 나지는 않더라도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나면 행사 시장서 돈벌이가 된다. K팝 붐이 일면서 웬만한 아이돌 그룹은 이제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를 끌기도 한다. 조금만 더 버텨 ‘한 방’이 터지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갖기 쉽다.
문제는 부작용이 적잖다는 점이다. 5인조 남자 아이돌그룹 멤버 A는 최근 기자와 만나 “요즘 술 마시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상대는 60대 여성이다. A는 “팀에 거액을 투자한 할머니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한다”며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 데리고 논다. 괴롭다”고 털어놨다. A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여자 연예인들의 스폰서 관련 소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실제로 C그룹은 부동산 회사로 둔갑한 조직폭력단으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데뷔 후 3개월 동안 5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는데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그들이 돌변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회수해갔다. 당시 C그룹 소속사 대표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팔아 돈을 마련했으나 결국 팀을 해체했다. 다른 유통사에서 선급금을 받아 재기를 노렸으나 빚의 악순환이 계속됐고, 그러다 보니 이 돈은 앨범을 만드는 데 온전히 쓰이지 못했다. 앨범의 질을 높이기보다 ‘펑크’ 난 회사 유지비와 기존 또 다른 투자자와의 계약 조건을 지키기 급급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연예인지망생 100만명 시대에 걸맞게 허례허식과 과시욕에 찌든 일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사업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일부 제작자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피해자는 가수”라고 주장했다. 가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러 유통사 혹은 투자자와의 계약 관계에 발목이 묶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사를 자주 옮기거나 몇몇 이름을 바꿔 나오는 가수들의 속사정이 바로 이러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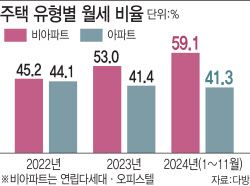





![[포토]설 앞두고 장보기 주저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724t.jpg)
![[포토] 국립현대미술관 2025 전시계획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605t.jpg)
![[포토]따듯한 커피로 몸 녹이며 출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453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박찬대-진성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373t.jpg)
![[포토]경찰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방식 공조 체제로 합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1036t.jpg)
![[포토]굳건한 동맹 확인한 韓美 외교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943t.jpg)
![[포토]韓-美 외교장관회담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786t.jpg)
![[포토] 서울시 신년인사회 기념촬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717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 '발언하는 추미애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683t.jpg)

![[포토] 메디힐 골프단 '최정상급 수준의 계약으로 최강 골프단 등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300073h.jpg)
!['삼성 HBM' 성공 확신한 젠슨 황…최태원과 곧 회동(종합)[CES2025]](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120b.jpg)

!["한국 가면 싸게 살 수 있대"…다시 북적이는 명동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111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