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 없이 달려왔던 지난 5년. 단 한 명의 승자밖에 존재할 수 없는 스포츠 세계에서 아쉬움을 뒤로했으나 박수받는 이들도 있다. 함께 경쟁하고 뜨겁게 싸웠기에 금메달은 더 빛나고 은메달, 동메달은 희망찬 내일을 그린다.
먼저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27·용인시청)은 선의의 경쟁 속에 아름다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은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과 최고 점퍼 대결을 펼쳤다.
우상혁과 바르심은 2m 33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며 일찌감치 2파전 양상을 펼쳤다. 결국 우상혁은 2m 35를 넘은 바르심에게 한 발 밀렸다.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2m 33을 넘고도 우승하지 못한 건 우상혁이 두 번째. 그만큼 금메달과 버금가는 높이를 뛰어넘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펼쳐질 다음 대결이 기대되는 이유다.
우상혁은 “바르심과 경쟁하는 게 정말 재밌다”라며 “내 재능을 더 끌어내 주는 선수”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아시안게임 결과는 아쉽지만 파리 올림픽이 있다”라며 “올림픽에선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자 탁구의 장우진(28), 임종훈(26·한국거래소)도 ‘세계 최강’ 중국에 맞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 장우진과 임종훈은 탁구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판전둥-왕추진조에 패해 은메달을 따냈다.
임종훈은 “실수해서 진다면 눈물이 날 텐데 (상대가) 말도 안 되게 탁구를 하니 시원섭섭한 기분만 든다”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은메달에도 장우진과 임종훈은 확실한 성과를 내왔다. 2021년 휴스턴, 2023년 더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남자 탁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에서도 21년 만에 결승에 오른 선수가 됐다.
‘아직도 김국영’이냐는 말을 들었던 남자 육상은 새 역사를 썼다. 베테랑 김국영(32·광주광역시청)을 필두로 고승환(26·광주광역시청), 이정태(27·안양시청), 이재성(22·한국체대), 박원진(20·속초시청)은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38초 74의 한국 타이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37년 만에 나온 남자 400m 계주 메달이었다.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힘을 쓰지 못하며 움츠러들었던 한국 육상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0년부터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출전 등 남자 육상을 대표했던 김국영은 “16년째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며 “국제대회에 자주 출전했지만 그만큼 실패도 많이 했다. 내가 한 실패를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 소식을 전한 근대5종도 금메달보다 더한 감동을 안겼다. 개인전과 단체전 석권을 노렸던 여자 대표팀은 승마에서 불운을 겪으며 메달권과 멀어졌다. 개인전 은메달을 따낸 김선우(27·경기도청)가 웃지 못한 이유였다. 이후 전체 레이스가 종료된 뒤 여자 대표팀의 동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김선우, 김세희(28·BNK저축은행), 장하은(19·경기도청), 성승민(20) 등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은메달보다 함께 나눈 동메달에 더 기뻐한 선수단이었다.
‘비보이계의 전설’ 김홍열(38)은 이번 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브레이킹 남자부 결승에서 나카라이 시게유키(21·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노장 투혼이 빛났다. 1985년생인 김홍열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시게유키보다 17살 많다. 그럼에도 음악과 춤 앞에선 나이를 잊었고 예술적인 춤사위로 아름다운 배틀을 벌였다.
김홍열은 “사실 이 나이에 경쟁하는 게 힘들다”며 “아픈 데도 많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견뎌준 내 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한다”며 “어떻게든 해내서 다행이다. 내 경기를 보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외에도 우천으로 결승이 취소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현(20·서울시청)과 17년 만에 2위에 오른 남자 럭비팀도 금빛을 향한 도약을 준비했다.










![[포토]축사하는 이상원 양형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200974t.jpg)
![[포토] 농가희망봉사단, 마을회관 기증품 전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200740t.jpg)
![[포토]축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200598t.jpg)
![[포토]오언석 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263t.jpg)
![[포토]지드래곤, 출국](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253t.jpg)
![[포토]이력서 작성하는 어르신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012t.jpg)
![[포토]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장에서 시위하는 조합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1008t.jpg)
![[포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0813t.jpg)
![[포토]]인사 나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동연 경기지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100709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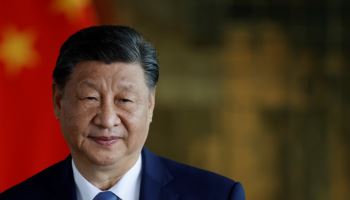

![한일 격차 이 정도였어?…10분의 1 수준 토큰증권 시장의 숙제는[마켓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201113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