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제공] 요하네스버그 남서부의 소웨토(Soweto)에 들어가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소웨토는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치안 불안으로 가장 악명높은 곳이다. 유색 인종 격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엔 흑인 외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주말인 지난 8일(토요일) 기자는 요하네스버그를 안내한 유학생 김주성(22·프리토리아대학)씨에게 "소웨토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는 "남아공에서 산 지 10년이지만 소웨토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흑인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며 망설이는 그를 어렵게 설득했다.
소웨토에는 요하네스버그 인구의 1/4인 130만명가량이 살고 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과 데스먼드 투투 주교 등 두 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거주지로도 유명하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형적인 빈민가 모습이 나왔다. 아이들은 쓰레기가 널린 곳에서 맨발로 바람 빠진 공을 차고 있었다.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말을 걸자 동네 청년 2~3명이 다가왔다. 기자 일행을 향해 "뭘 찍는 거냐"며 약간 위협적인 몸짓을 보였고 한명이 "노 카메라"라고 외쳤다. 더 이상 머물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재빨리 발을 돌렸다.
빈민가 주민인 50대 여성 응골라씨는 동양인인 기자 일행을 보더니 반색하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월드컵에서 행운을 빈다. 꼭 승리해라. 우리 모두 축구 덕분에 행복하다"고 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려진 소웨토였지만 이곳 사람들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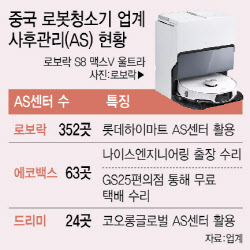



![[포토]로제, 전세계 '아파트' 열풍으로 물들이고 입국](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1326t.jpg)
![[포토]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857t.jpg)
![[포토]수능 안내문 살펴보는 일성여중고 수능 최고령 응시자 임태수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809t.jpg)
![[포토]변화하는 안보환경과 해군의 미래전 대응, '축사하는 이기정 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781t.jpg)
![[포토] 포장김치 구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687t.jpg)
![[포토]'벗어둔 학교 과 점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627t.jpg)
![[포토]강한나, 우아한 등장](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088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박찬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200338t.jpg)
![[포토]환율은 오르고 코스피-코스닥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1008t.jpg)
![[포토]'이보미 골프 갤러리'오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375t.jpg)

![[포토]'이보미 골프 갤러리'오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100375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