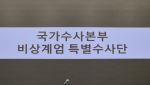정부 부처가 자동차 관련 규제권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명분은 국민과 소비자 편익제고다. 그렇지만 속내는 밥그릇 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문해도 행정 현장에선 정반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틈바구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처마다 규제 강화 … 명분은 국민 속내는 부처 기득권
국토부는 지난 18일 자동차 연비 사후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석창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패널티를 주는 것이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사실 자동차 표시연비는 방식이나 기준에 따라 측정치가 다르고 체감 연비와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다. 이런 분위기를 업고 국토부는 그동안 승용차 연비규제를 담당하던 산업부를 대신해 보폭을 넓혀왔다. 최근엔 산업부의 반대에도 승용차의 연비를 사후조사해 2종(현대차(005380) 싼타페, 쌍용차(003620) 코란도 투리스모)을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두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됐다.
현재 두 부처는 연비 측정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이 중재해 통일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부처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물려 통일안이 나온다 해도 규제권을 두고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부처 사이에 낀 기업‥소비자로서도 도움 안돼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후든 사전이든 한 쪽만 잘 관리감독만 하면 될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란 명분으로 부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대표적인 과잉규제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정책에 따라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내놓은 원안은 ‘MB’시절 구상했던 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환경부 원안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국산차 구입자에게 돈을 거둬 연비가 좋은 고급 수입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꼴이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원안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환경부가 자극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환경논리에 매몰돼 규제를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복이나 과잉 규제는 정부 내에서 일원화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조율하는 게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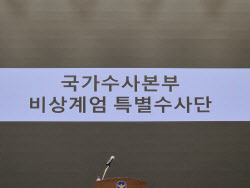



![[포토]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1103t.jpg)
![[포토] 작품이 된 생활용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968t.jpg)
![[포토]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952t.jpg)
![[포토] 롯데뮤지엄, '뷔르템베르크 왕실의 주얼리 세트'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56t.jpg)
![[포토]법정 나서는 조국혁신당 의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41t.jpg)
![[포토]야6당,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20t.jpg)
![[포토]이재명 대표 만난 정순택 대주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16t.jpg)
![[포토]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 선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00t.jpg)
![[포토]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673t.jpg)
![[포토]발표하는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511t.jpg)
![[포토]박현경,자기 관리 중요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10016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