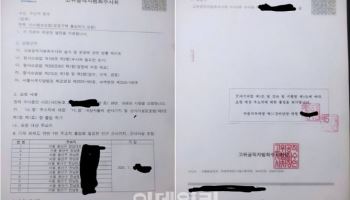|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무안구조대 소속 이은호(41) 소방위는 지난달 29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16년 근무한 이래로 이번이 가장 처참했다”고 회상했다. 이 소방위는 참사 당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가량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철수한 후로는 별다른 휴식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함께 한 팀원도 자다가도 생각난다고 하고 여전히 음식을 가릴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습된 시신을 분류했던 무안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34)씨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사고 첫날 투입됐던 A씨는 “쉬던 날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갑자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 그땐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도 당시 생각이 종종 떠오른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사후조치들만으로는 관리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소방서 소속 13년 차 구조대원 B씨는 “앞선 심리상담을 보면 30분~1시간 정도 대화를 한다”며 “분기마다 PTSD 교육도 받지만 교육을 딱 받았다는 느낌은 적긴 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원 수 대비 상담 인력이 적다는 문제도 있다. 이 소방위도 “아직 한 팀(5명) 정도 밖에 상담이 안 됐다”며 “인원이 많아 상담 시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PTSD라는 개념이 정착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로 트라우마 관리가 다소 개선된 소방과는 달리 폐쇄성을 띠는 군 조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직 특전사 대위인 B씨는 “심리지원은 대대~여단급 부대에 별도로 있지도 않고 한국군은 PTSD 관련 실전 경험이 적은 편”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
이 때문에 전문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제기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참사 최일선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센터가 개설돼야 한다”며 “소방서, 군대 등 내부에 작게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분 노출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근거리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김동욱 소방노조 사무처장도 대응 인력을 위한 콘트롤타워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처장은 “사후 심리치료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군도 빨리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동기록과 상담기록 등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가 일을 맡겼다면 그에 따른 지원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토]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899t.jpg)
![[포토] 설 명절 자금 방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72t.jpg)
![[포토] 우체국쇼핑 "설 선물 특가로 구매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40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하는 차량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878t.jpg)
![[포토]'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770t.jpg)
![[포토] 이동활 한우자조금위원장, "올 설에 한우드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684t.jpg)
![[포토]'유튜브 생중계 화면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614t.jpg)
![[포토]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576t.jpg)
![[포토] 추위 잊은 송어얼음낚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345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302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