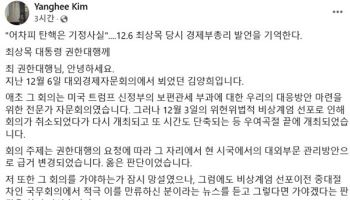하지만 J씨는 곧 후회했다. 진료 기록상에 적힌 K씨의 병력이 자신의 것으로 오인돼 사보험 가입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J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 했고, K씨는 내지 않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서울 강남구의 A건설에 근무하던 P(25)씨는 지난해 8월 눈에 통증이 있어 인근 안과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첫 진료인데도 자기 이름으로 예전 치료 기록이 의원에 남아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공단이 조사한 결과 A건설 대표인 Q(50)씨가 친분이 있는 불법체류 조선족 R씨에게 P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R씨는 이를 이용해 3개월간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대여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음주 제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 관련법규에는 건강보험증 소지자와 환자가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 절차 규정이 전혀 없으며 대여와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건강보험증의 편법적 이용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장 의원실의 김봉겸 보좌관은 “보험증 대여와 도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환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화나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처벌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액도 늘고 있다. 2003년 6,400만원에서 2006년 1억5,500만원으로 3년 만에 2.5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피해액은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건수가 ‘빙산의 일각’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체납에 따른 대여가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민등록말소는 26%이었으며 불법체류자에 의한 대여도 8%에 달했다. 분실과 도용 등 기타 사유는 38%였다. 건강보험공단측은 “대여와 도용이 은밀하게 이뤄져 사후확인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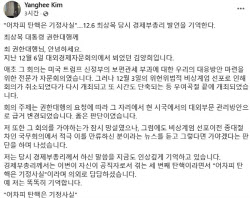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입장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46t.jpg)
![[포토] 달려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15t.jpg)
![[포토]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363t.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
![45년간 자리 지킨 ‘포프모빌’…전기차로 바뀌었다는데[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16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