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세청이 ‘경상소득 합계 1억엔(약 9억8811만원) 이상’, ‘상속재산 5억엔 이상’, ‘유가증권 배당액 등 수입 4000만엔 이상’ 등 10개 기준에 해당되는 슈퍼리치를 특별분리해 관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흔히 ‘케이니’(繼2)로 불린다. 세무조사관이 확정신고서와 소득 2000만엔 이상 납세자의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보유자산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슈퍼리치를 뽑는다. 이후 ‘케이니’로 묶어 각 세무서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국세청 간부 출신이 “각 세무서에서 ‘케이니’의 개인조사파일을 만들어 자산상황과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쿄 도심에 있는 세무서 하나당 500명 이상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나라빚이 1000억엔을 넘어섰다. 경기 부양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이어 7월에는 유가증권 1억엔 이상 소지자의 해외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들의 ‘절세’방법이 다양해지는 점도 ‘케이니’를 관리하게 된 이유다. 10년 전만 해도 소득세는 각 세무서 ‘개인 과세 부문’ 담당자가, 상속세는 ‘자산 과세 부문’ 담당자가 조사했으며 개인이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겼다.
타나베 마사유키(田邊政行) 타나베국제세무사무소 세무사는 “고액자산가가 엄격한 세금을 적용하는 일본보다 세율이 낮은 신흥국으로 국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며 “국세청과 부유층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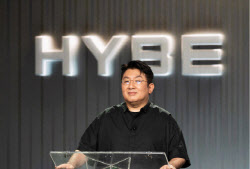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포토]이틀 연속 폭설에 눈 쌓인 북한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096t.jpg)
![[포토]서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81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