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차량시험팀은 미끄러운 노면을 찾기 위해 며칠을 날아 스웨덴의 호수를 찾았다. 얼음 위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었지만 정작 문제는 몰려온 파파라치.
이를 피하기 위해 수십 km의 눈길을 헤치며 달려 그제서야 브레이크의 제동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
차량 시험팀은 한계령, 지리산 등 국내 도로 적합성 평가를 위해 가혹한 운전 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녔다. 국내 어떤 도로에서도 싱싱 달리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가장 덥다는 8월 두바이로 날아갔다. 냉각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48℃의 찜통 속, 70℃까지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또 달렸다.
`K7`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새롭게 도입한 준대형 샤시 플랫폼이다. 기존의 TG베이스가 아닌 새로운 뼈대를 만드는 것은 기아차로선 부담이었지만 명차를 위해 과감히 샤시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다.
차량기술센터 연구원은 경쟁차의 차체 부품 형태와 치수를 조사하기 위해 차체 바닥에 들어가길 수십 차례. 나중에는 아예 시트 쿠션을 깔아 놓고 누워서 조사를 했다.
기아차의 K7에 대한 자부심은 이같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다. 연구원들은 "너무 고생스러워 다시 하라면 몸서리를 칠 정도지만, 세계 최고 명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 가능했다"며 입을 모았다.
`포텐샤` 단종 이후 8년 만에 나온 `K7`의 탄생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9번의 품평회를 거쳐 개발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무렵, 일부 소비자들에게 차를 선보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지 않았다. 출시를 앞둔 `K7`의 위기였다.
`K7`의 품질력은 양보할 수 없는 기아차의 자존심이었다. 양산 일정을 미루면서 외장 후면부와 내장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지금의 `K7`이다.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총괄 본부장의 자부심도 이같은 직원들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양 본부장은 "`K7`은 5년간 4500억원을 투입해 만든 명차"라며 "탁월한 주행성능과 동급 최고 연비 등으로 미래차의 새 지평을 여는 좌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품질력을 자부했다.
이현순 현대·기아차 부회장도 "K7은 올해 아중동 지역을 시작으로 중남미·중국 등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전략 시장인 북미에는 내년에 본격 출시될 기아차의 야심작"이라고 강조했다.
|
▶ 관련기사 ◀
☞기아차, `스포티지R` 공개 `어떤 모습일까?`
☞기아차 "`쏘울` 고객, 스키장서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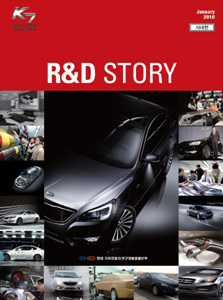






![[포토]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000886t.jpg)
![[포토]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10일 운영 종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000832t.jpg)
![[포토]박종준 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000511t.jpg)
![[포토] 맘스홀릭베이비페어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108t.jpg)
![[포토]수도권 첫 한파주의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027t.jpg)
![[포토]'무죄'받고 이동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98t.jpg)
![[포토]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87t.jpg)
![[포토]전국정당을 넘어 K-정당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48t.jpg)
![[포토]발언하는 권영세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599t.jpg)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캠핑 떠나는 전현무…든든하게 곁 지키는 'NEW 무카' 정체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100176h.jpg)
![[단독]한덕수 탄핵심판 대진표 완성…에이펙스 VS 양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100050b.jpg)

![“하루 만에 휴지조각”…날개 꺾인 양자컴퓨터, 베팅해도 될까[왓츠 유어 ETF]](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10021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