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 지표들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연준이 `장기간(extended period)`,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exceptionally low level)`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대세.
지난해 3월 FOMC에서 제로 금리를 결정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유지된 이 표현이 지난 달 회의 직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최근 벤 S.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만만치않은 역풍에 직면해 있다"면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잘라 버린 바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버냉키 의장은 올해 초에 비해선 확실히 조금씩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과연 이번 회의에선 어떤 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까 주목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회의에선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고용이나 신용시장 상황 등을 볼 때 미국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하기 보다는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연준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금리 인상의 시점은 경제의 발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 수 개월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준은 내년 6월이나 8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미묘한 수준의 경기 진단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냉키 의장이 느리고 신중하게 바뀌고 있다면서, 올해 초만 해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점점 `통화 정책의 정상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또 연준 외부에선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단순하게 집착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융 상황을 긴축할 수 있지도 않으며, 따라서 관건은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연준, 통화정책-유동성정책 분리"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이 통화 정책과 유동성 정책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시 말해 금리를 움직이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변화가 없겠지만, 유동성 정책의 조항들을 일부 바꾸면서 출구 쪽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그리고 이런 방편 중 하나로 연준이 재할인율(Discount rate)을 인상하면서 2월1일자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상당수를 그만둘 것이라고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재할인율은 연준이 일반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줄 때 부과하는 이자율로, 직접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결국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심리를 불러올 수 있다. FT는 이 경우 통화 긴축에 아주 적게 발을 걸치면서도 본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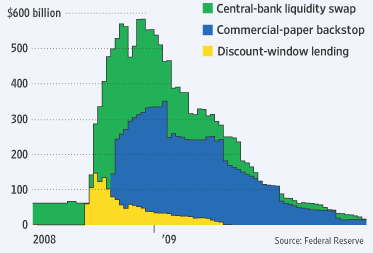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포토]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권한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78t.jpg)
![[포토]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609t.jpg)
![[포토]인사청문회 출석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404t.jpg)
![[포토]아침 영하 10도, 꽁꽁 얼어붙은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84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