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참여정부 동안 폭등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던 일련의 규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강화된 양도세, 거래제한 등으로 거래침체가 심각했다. 부동산에 과도한 담보대출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침체는 곧 가계부채 위기로 이어졌다. 그래서 MB 정부 이후 부동산 대책은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도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졌으며 18대 대선에서는 ‘하우스 푸어’구제대책이 부동산 공약의 핵심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이다. 그 후 3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신규 공급은 과거 200만호 주택공급시기 만큼 많았다. 또다시 과잉공급에 의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게 바로 1년 전 상황이다.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거 가격폭등기의 규제를 모두 부활시켜야 할 만큼 달라진 것일까?
우리가 시장변화를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와 소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의 변곡점 근처가 가장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준다. 지난 3년 동안의 공급효과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지금 시장에는 신호와 소음이 섞여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주는 ‘투기억제’ 신호는 자칫 향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금의 정부정책 기조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도 마찬가지이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초기수혜자는 꽤 큰 자본이득을 얻었지만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했으며 뒤늦게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기회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서민층이라도 어느 정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계의 자산형성이 천지차이가 난다.
얼마 전 주택구입을 준비 중이던 한 지인은 정부정책 발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신용대출로 부족분을 메웠다고 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2배 정도 이율이 높다. 어렵게 주택구입을 결정했는데 정책변화로 금융기관의 문턱이 하루아침에 높아진 것이다. 정책이란 정권에 따라 다소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주는 정책은 이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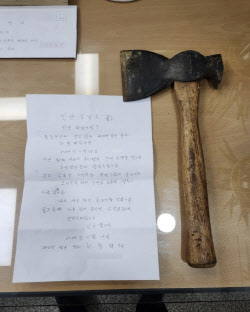





![[포토]12월 LPG 국내 프로판 가격 인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32t.jpg)
![[포토]초코과자 가격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24t.jpg)
![[포토]점등 앞둔 사랑의 온도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12t.jpg)
![[포토]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94t.jpg)
![[포토]짙은 안개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27t.jpg)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엔화 강세’가 촉발한 달러 약세…환율 1390원대 지속[외환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119h.jpg)
![반백년 두 가정 두고 살아온 할아버지의 상속 고민, 결국[별별법]](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07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