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2. B씨는 2011년 8월 서울 시내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목과 등 쪽을 다친 큰 사고였다. B씨는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3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름 휴가철,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선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 앞서 A씨와 B씨 사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다. 그러나 두 사건의배상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건은 ‘경고문’이었다.
다이빙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펜션 수영장에는 있었지만, 호텔 수영장에는 없었다. 법원은 A씨 사건에서 “수영장 입구와 안쪽에 다이빙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며 “펜션 주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B씨 소송에서 법원은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못하도록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모씨는 2012년 10월 여행사를 끼고 떠난 중국 여행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 부위 등을 다치고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행사가 정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약관을 근거로 댔다. 약관에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었다. 여행사 책임은 50% 정도였다.
사고가 여행자 과실 탓이면 약관도 무의미하다. 70대 남모씨는 2012년 2월 가족과 함께 떠난 남태평양 여행지에서 스노쿨링을 하다가 익사했다. 유족은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여행사 측이 스노쿨링의 위험을 남씨에게 알렸고, 수영을 못하는 남씨가 가이드 없이 바다에 들어간 점을 이유로 여행사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는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따라올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펜션 주인 홍모(59·여)씨는 지난해 7월 7살 아동이 펜션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한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구명조끼도 배치하지 않은 게 과실로 인정됐다.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오모(25)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휴양지 수영장에서 지적장애 2급의 12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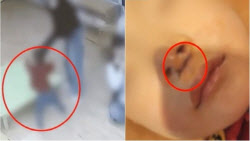


![[포토] 송민혁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474t.jpg)
![[포토] 화사, 매력적인 자신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93t.jpg)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10억 벌었다? 자칫 다 날릴 수도"…'잠실 로또' 당첨 주의점은?[떳다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108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