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도입한다던 독자신용등급은 여전히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병폐에 노출돼 3개월 만에 메스를 댔다.
지난 달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회사채 발행사(기업)와 주관사(증권사)가 제시하는 금리에 대해 시장과의 괴리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공시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시행 후 회사채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가 활성화되고, 공정한 가격발견 기능이 향상돼 회사채 발행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수요예측 제도는 회사채 발행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데, 발행사는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반대로 기관은 이자를 많이 받아서 수익률을 높이려 한다. 발행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 기관이 외면하고, 중간에 낀 증권사들은 골치만 아픈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수요예측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발행사와 시장의 괴리는 좁히지 못했다. 기관들의 투자는 안전한 우량등급 회사채에 몰렸고, 아예 수요예측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요예측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당국은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책을 찾자고 했다. 3개월 만에 나온 보완방안은 시작하기도 전에 삐그덕대고 있다.
애초부터 시장을 향한 당국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모양새다. 앞으로 3개월은 회사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후에는 또다른 보완책이 나올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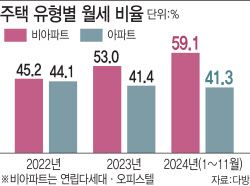





![[포토]설 앞두고 장보기 주저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724t.jpg)
![[포토] 국립현대미술관 2025 전시계획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605t.jpg)
![[포토]따듯한 커피로 몸 녹이며 출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453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박찬대-진성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373t.jpg)
![[포토]경찰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방식 공조 체제로 합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1036t.jpg)
![[포토]굳건한 동맹 확인한 韓美 외교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943t.jpg)
![[포토]韓-美 외교장관회담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786t.jpg)
![[포토] 서울시 신년인사회 기념촬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717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 '발언하는 추미애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600683t.jpg)
![[포토] 메디힐 골프단 '최정상급 수준의 계약으로 최강 골프단 등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300073h.jpg)

!['삼성 HBM' 성공 확신한 젠슨 황…최태원과 곧 회동(종합)[CES2025]](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304b.jpg)
![[속보]與권영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에 요청"](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318h.jpg)
!["한국 가면 싸게 살 수 있대"…다시 북적이는 명동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111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