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경영)가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제도(Attorney-Client Privilege·ACP) 인정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이 준법경영을 목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부분까지 모두 제재를 위한 증거로 이용하면서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를 꺾는다는 불만이다.
법무팀부터 터는 공정위…기업들 “자문에 발목 잡힐라” 9일 이데일리가 최근 몇 년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기업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대부분 법무팀이 포함된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가장 먼저 찾아 자료를 확보한다. 특히 내부거래,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로 조사를 할 때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보다 먼저 법무팀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기업과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기업이 외부 또는 내부변호사에 의뢰해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다.
공정위가 법률자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까닭은 기업의 우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특정 이슈가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혐의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이는 제재를 위한 증거로 사용되기 쉽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정 정책 강연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
실제로도 공정위는 자문 자료를 제재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에서도 공정위 심사관(사무처)은 최 회장이 직접 한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우려해 자문을 받았고, 로펌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일부 표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률자문 특성상 모든 가능성을 담는 것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의뢰를 받은 현안이 95%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문을 하는 로펌은 향후 책임을 고려, 약간의 우려도 함께 기재하게 된다. 기업 관계자는 “자문을 요청할 때는 모든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로펌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기재하는데, 공정위는 이중 부정적인 해석만 강조해 증거로 쓴다”고 토로했다.
서울지역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중견기업들도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자문을 받고 싶어하지만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까봐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전했다.
사실상 강제조사권 가진 공정위…전경련 7년째 “ACP 도입하라”기업들이 공정위에 ACP 도입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데다 사실상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위 특유의 임의조사 방식 때문이다.
 | | (자료 = 전경련) |
|
공정위는 비교적 혐의 및 압수장소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사용하는 검찰 등과 달리 포괄적인 임의조사를 한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에 따르면 정확한 내용 없이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 굵직한 위반 혐의만 기재해 들어오는 경우도 다수다. 결국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많은 자문을 받았던 기업일수록 많은 자료를 내주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임의조사로 거의 모든 자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인지하지 못한 내용까지 주게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다. 행정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조사인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ACP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게 기업과 법조계의 우려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15년 공정위가 투명성 강화 및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사건처리 3.0’을 발표했을 때도 ACP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공정위 처분은 1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ACP를 인정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실체적 진실에 더욱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후로 7년이 지났으나 공정위는 전혀 ACP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공정위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 이제라도 ACP 도입이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EU 등은 이미 도입…공정위 “형사제도부터 달라져야”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ACP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EU·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위스·싱가폴 모두 자국 공정거래법이나 형사법·상법 등에 이를 명문화했다. 경쟁당국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ACP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셈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ACP를 인정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ACP 제도가 도입되려면 훨씬 더 엄격한 형사 절차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아직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며 “형사제도에도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그보다 낮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행정조사인 공정위 조사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무부보다 공정위가 ACP 인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말부터 전반을 점검하는 ‘사건업무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ACP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ACP가 법률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문율에 가깝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규정을 떠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변호사 특권이 정확히 명문화돼 있지 않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과도한 방어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등에서 빨리 논의해 법적 근거 및 수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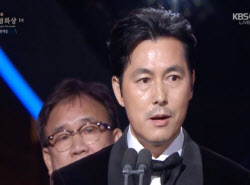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6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