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욕타임스(NYT)는 스탠리 오닐 회장과 다우 김 공동사장 등 메릴린치 경영진을 다시 반추했다.
|
다우 김에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06년은 최고의 해였다. 그의 월급은 35만달러에 불과했지만 그가 받은 보상금액은 월급의 100배인 3500만달러에 달했다.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주변 동료들 역시 그 해 주머니를 두둑히 채웠다. 2006년 메릴린치는 보너스 비용으로 50억~60억달러를 지출했다.
2006년 메릴린치가 거둔 75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익은 결국 신기루로 끝났다. 메릴린치는 이후 2006년 벌어들인 이익의 세 배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는다. 바로 이익을 급격히 끌어올렸던 모기지 관련 투자 때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익 흐름과는 반대로 보너스 지급 추이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규제당국과 주주들이 금융위기 파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후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었느냐다.
최근 10년간 월가는 그야말로 신(新) 황금기를 맞았고 보너스 시즌은 시장이 만들어낸 부자들의 연중 축하행사 기간이었다. 월가는 갈수록 그들의 파이를 키웠다.
그는 주택시장과 메릴린치를 통해 미동을 일부 느끼기도 했지만 여전히 낙관론이 넘쳤고, 2006년 여름 그의 주요 부하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절친한 동료들을 영입했다. 그 중 한 명인 데일 라타지오의 경우 그 해 500만달러짜리 집과 함께 해변을 낀 부동산을 산다.
이후 이들은 모기지 관련 사업 강화에 뛰어들었다. 그해 9월 13억달러짜리 모기지업체인 퍼스트프랭클린을 샀고, 위험한 모기지를 수익성이 높은 채권과 묶어 팔았다.
같은 달 다우 김은 헤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오닐은 그를 끊질기게 설득해서 다시 앉혔다. 그가 남겠다고 하자 트레이더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메릴린치는 채권팀의 성공을 크게 축하했고 11월 페블비치 골프장에서 사흘에 걸쳐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했다. 물론 다우 김 역시 이곳에서 열중한 골퍼 중 하나였다. 그는 핌코의 창업자인 윌리엄 그로스, 베어스턴스의 랠프 씨오피와 필드를 누볐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 보너스 잔치는 지속된다. 오닐만 해도 4600만달러를 챙겼고 다우 김은 3500만달러를 받았다.
그들의 투자가 결국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땐 이미 보너스를 챙겨버린 뒤였다. 2007년 메릴린치의 타격은 더욱 분명해졌지만 이미 다우 김은 메릴린치를 떠나 있었다.
다우 김은 2007년 헤지펀드를 오픈하기도 했지만 재빨리 접었고, 그의 동료 두 명은 런던 소재의 헤지펀드에 안착했다. 세 사람은 2007년 보너스를 못챙겼지만 오닐의 경우 메릴린치를 떠날 때까지 1억61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메릴린치는 하나의 전형일 뿐이다. NYT는 월가의 경우 많이 트레이더들이 보너스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리스크를 무시하고 그들의 상사들 역시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메릴린치의 존 테인 회장을 비롯, 골드만삭스와 UBS 등 투자은행 경영진들이 올해 보너스를 만류했지만, 월가 모두가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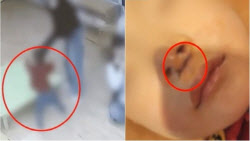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