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지난 2011년 이통사에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을 강제했다.
“기본료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통신료 인하를 다시 꺼냈다.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와 2만4000~3만6000원 상당의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역시 음성통화료 20% 인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 방침은 당초 약속한 20% 인하를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짜낸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다. 월 1000원을 깎아줬다고 “야, 싸다”고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 작년 이통사들은 기본료 인하 여파로 1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이행하느라 이용자에게 실익도 주지 못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부담만 준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통신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약에는 요금이 왜 비싼지, 요금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통신요금 구조를 만든 기형적인 단말기 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조사와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듯이 비싼 통신요금은 오래된 보조금 관행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탓이 크다.
또 시장 경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나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비싸니 때려잡자”는 식의 단세포적인 공약은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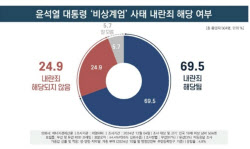




![[포토]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534t.jpg)
![[포토]서울 지하철, '계엄 파문 속' 3년 연속 파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82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79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32t.jpg)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국회 월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332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부산·대구에서도 60% 이상[리얼미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353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