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하루 거의 20억달러 가량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 이를 메워주는 건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 이머징 국가 자본이다.
경제학 이론상 자본은 성장이 완만한 부국(富國)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빈국(貧國)으로 흐르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 가운데 중국이 21%를, 브라질이 8.4%, 러시아가 2.8%,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 나머지를 담당했다.
WSJ은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영국 런던을 통해 들어오는 걸프만 국가 자본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나 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신 오히려 저축을 하거나 자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
이런 추세는 지난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 비롯됐다고 WSJ은 진단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고, 그 교훈으로 외환을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브라질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자국 통화 절상을 막기 위해 달러를 사기 시작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펠로우 브래드 셋서는 지난해 이머징 국가 중앙은행들은 약 1조2000억달러의 외환을 추가했으며, 이 가운데 8000억달러가 달러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수익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MIT) 경제학 교수인 크리스틴 포브스의 최근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미국 투자로 인해 올린 연간 수익률은 평균 4.3%였다. 반면 미국인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연 11.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포브스는 "이들은 미국 금융 시장의 효율성에 아마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에 계속 투자할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현재로선 이런 투자가 계속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 등은 투자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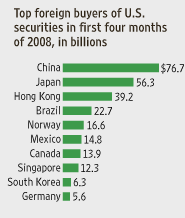





![[포토]'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63t.jpg)
![[포토] 금융통화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55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43t.jpg)
![[포토]권영세 '이재명 대표, 이제 흡족하십니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19t.jpg)
![[포토]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678t.jpg)
![[포토] 코스피, 코스닥 내림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243t.jpg)
![[포토]'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로 이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58t.jpg)
![[포토] 네스프레소 2025 캠페인 론칭 토크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14t.jpg)
![[포토] '와일드무어' 미디어 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05t.jpg)
![[포토]공수처 차고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 차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861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