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 확대 ▲첨단기업유치 ▲외국교육기관, 자사고 설립 등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한다면 막대한 국력 낭비만 초래할 것"(야당)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책이 무효화되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지자체) 등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손은 든 것이다.
혁신도시를 타깃으로 삼아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일단 무산된 셈이다. 거꾸로 말하면 참여정부의 용의주도한 `대못 박기`가 성공한 것이다.
혁신도시 논란은 국토정책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론` 대 `수도권경쟁력강화론`의 대결구도 속에서 나왔다.
새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만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꿔 3대 권역제(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를 없애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달고 다닌다.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인구집중, 교통난, 환경문제 등 수십년동안 부닥쳤던 수도권 과밀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땅값이 오르면 생산원가가 높아져 기대했던 규제완화 효과도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70년대 이후 국토정책은 수도권 과밀억제에 초첨이 맞춰져 왔다"며 "그동안의 기조를 일시에 바꿀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된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국토정책의 기조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두고자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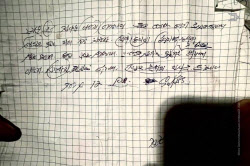




![[포토]크리스마스엔 스케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45t.jpg)
![[포토]37번째 거리 성탄예배 열려 방한복·도시락으로 사랑 나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31t.jpg)
![[포토]조국혁신당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19t.jpg)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