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 게이츠가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란 한 마디로 기업도 가난한 이들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한발 더 나간 개념이다. 그는 재단을 통해 자선활동에 전념하고자 오는 7월쯤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천문학적 기부로 익히 알려진 회사 오너의 이런 마인드가 엄청난 경쟁과 견제, 독과점 논란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건재하게 만드는 밑거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동네북이었던 맥도날드사.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사이즈 미(Super Size Me)`에서 비만과 건강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덕에 여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코스트코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준다. 이직률이 한 자릿수 밖에 안된다. 월마트는 50%가 넘는 이직률 탓에 연간 60만명의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오랜 기간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
`사랑받는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낸다`는 이론을 제시한 미국 벤틀리대학의 라즈 시소디아 교수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 사회와 협력업체, 주주, 고객, 종업원을 꼽는다.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야 잘 팔리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 높은 이익을 내는 게 최고 선(善)이었다.
그러나 `돈 버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이 되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훌륭한 제품이라고 칭찬을 받더라도 납품단가를 후려쳐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기업은 더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해마다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척척 안기면서도 유독 직원들에게는 박봉을 강요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윈-윈(win-win)을 넘어 이제는 이들 5개 주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5-윈(5-win)`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활동을 규제해선 안된다. 기부나 사회공헌이 문화적 규제로 작용해서도 곤란하다. 핵심은 기업의 자발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부자를 매도하기보다 이들이 스스로 사회공헌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한 방편이다.
더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ISO26000`이라는 기업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들의 투자나 기업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사회공헌 활동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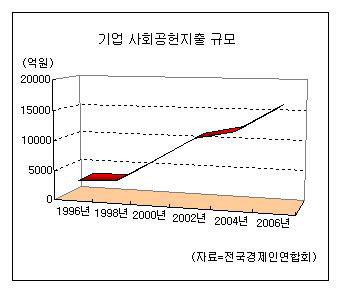





![[포토]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678t.jpg)
![[포토] 코스피, 코스닥 내림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243t.jpg)
![[포토]'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로 이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58t.jpg)
![[포토] 네스프레소 2025 캠페인 론칭 토크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14t.jpg)
![[포토] '와일드무어' 미디어 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05t.jpg)
![[포토]공수처 차고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 차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861t.jpg)
![[포토]사다리로 차벽 넘는 공수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701t.jpg)
![[포토]공개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422t.jpg)
![[포토]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899t.jpg)
![[포토] 설 명절 자금 방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72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단독]尹 16일 헌재 출석하려 했다…"변론권 보장 못받게 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50148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