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후퇴 과정에서 돈주머니를 꽁꽁 동여맸던 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사냥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S&P500에 편입된 382개 비금융회사들의 현금보유 규모는 지난해 4분기 총 9320억달러(단기운용 포함)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에 비해 8%, 전년 동기에 비해 31% 늘어난 수준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현금보유 규모다.
위기에 대비해 인력 구조조정과 점포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축적해 놓은 결과다. 전체 9320억달러의 현금보유액 가운데 IT업종은 37%를 차지해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했고, 제조업체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현금이 많다 보니 올들어 이뤄진 미국내 M&A도 주식교환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 현금지급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주식시장내 자신들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돼 있다는 생각에 비축해뒀던 현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바이백(자사주매입)이 늘어난 것도 막대한 보유현금 덕분. S&P는 4분기 자사주매입 규모가 전분기 대비 37%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례없는 저금리에다, 금융위기를 넘긴 신용시장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있고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체인인 월그린도 마찬가지다. 월그린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웨이드 미퀠런은 "우리는 돈다발을 깔고 앉아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깔고 앉아 있어봐야 몇푼 안되는 이자 밖에 벌 수 없다"면서 "이는 정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현금을 쌓아놓고만 있는 것은 적절한 돈 굴리기가 아니다"고 말해 M&A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31% 감소한 알코어 역시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보유규모는 오히려 두배로 늘어난 15억달러에 달했다. 알코아 경영진이 이처럼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다가는 경영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WSJ는 "현금을 비축해둔 많은 기업들이 여러모로 이용처를 찾다, 결국 M&A시장 쇼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때를 대비해 돈을 아끼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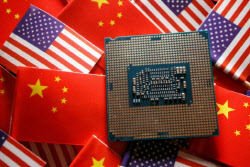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속보]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3.5%↑](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067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