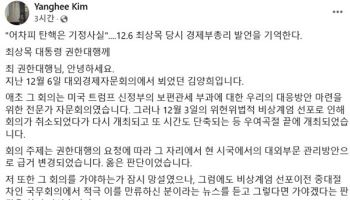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중고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폐업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매도자의 곤궁한 처지와 맞물려 소비가 이뤄지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경기형 감성 마케팅인 셈인데 일부는 시류를 탄 상술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
상품 상당수는 `개업 한 달 만에 폐업`, `눈물의 급처분`, `원가 이하 떨이 판매` 등 사연을 달고 있다. 판매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폐업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고자 매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불경기마다 터 잡아 성행하는 상행위가 바로 `폐업 마케팅`이다. 환란과 금융위기 같은 불황이면 `부도 정리`, `창고 대방출` 등 마케팅이 일어난 것이 비슷한 맥락이다. 판매자의 곤궁한 처지를 매개로 소비가 이뤄지는 점에서 감성 소구형에 가깝다.
다만 실제로 폐업 탓에 매물이 흔해진 것이지는 따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폐업자 수는 코로나 19를 전후로 절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폐업 매물은 일반 중고 매물과 섞여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이유는 여럿인데 따질 겨를 없이 `불가피한 폐업`으로 읽히는 게 코로나19 시대상이다.
중고거래 업계 관계자는 “중고 상품은 어쩌다 매물로 나왔는지 따질 수 없고 진위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특성이 시장의 질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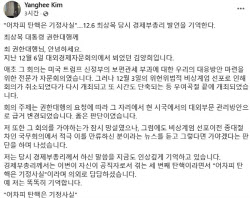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입장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46t.jpg)
![[포토] 달려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15t.jpg)
![[포토]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363t.jpg)
![45년간 자리 지킨 ‘포프모빌’…전기차로 바뀌었다는데[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166h.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