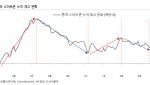|
협소주택은 사회의 ‘틈’에 자리한다. 주거공간에 대한 기존 관념과 환경의 빈 틈을 파고든 집이기 때문이다. 우선 협소주택은 물리적으로 도심의 자투리땅을 비집고 들어선다. 또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도심 생활권 모두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의 삶의 틈새를 꿰찬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량공급주택의 획일적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의 간극에 대한 회의가 협소주택 열풍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원이었다. 대형 단지에 들어서면 평균 6억원짜리 집이 겹겹이 쌓여 사방으로 늘어서 있는 셈이다. 가끔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필자는 눈앞의 풍경에서 ‘건물’을 지워 보는 상상을 한다. 모두가 같은 곳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삶은 표준화 되고 행위는 획일화 된다. 이는 하나의 거푸집으로 찍어 쌓은 아파트의 태생적 한계다. 수억원, 수십억원이 우스운 집에서 우리는 마음껏 노래를 부르지도, 뛰놀지도 못함에도 심지어 같은 방식의 삶을 너무 쉽게 허락하고 있다. 몰개성의 집에서 살아 온 이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바란다면 과욕일 것이다. 결국 숫자로 계량된 다른 가치들에 짓눌려 우리는 자유로운 삶과 열린 사고의 가능성을 아파트에 가두어 두고 있는 꼴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협소주택의 열기는 이러한 획일화된 주거문화에 대한 자각이자 반발이다. 주택을 재산 불리기의 수단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가족의 몸에 꼭 맞는 맞춤복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팜플렛을 보고 고르는 집, 수만명이 서너개 타입의 모델하우스에 몰려가 고르는 집이 아닌 가족의 생활 양식과 행동 패턴을 고민해 만들어 내는 ‘인생 플랫폼’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작다’라는 양적 문제보다 ‘몰개성’이라는 질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생각하는 이들에게 협소주택은 도심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삶과 공간을 구체화 해 볼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었다.
|
- 현(現) Architects H2L 대표
- 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 건축사/건축학박사/미국 친환경기술사(LEED 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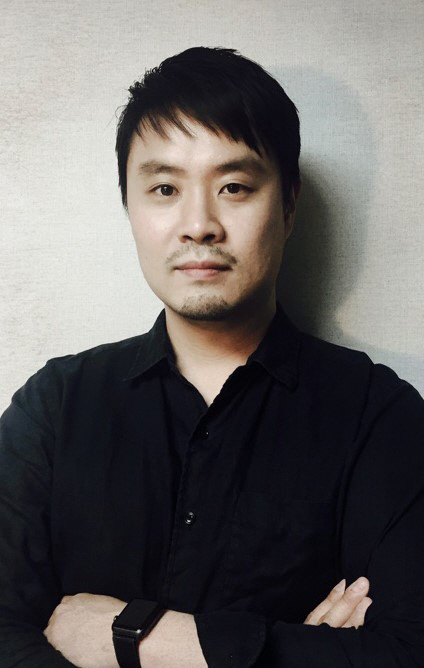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포토]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권한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78t.jpg)
![[포토]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609t.jpg)
![[포토]인사청문회 출석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404t.jpg)
![[포토]아침 영하 10도, 꽁꽁 얼어붙은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843t.jpg)
![[포토]스케이트 타는 시민들로 북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317t.jpg)
![[포토]기름값 10주째 올라…전국 휘발유 평균 1652.2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58t.jpg)
![[포토]크리스마스 분위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48t.jpg)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