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티은행 코리아타운지점은 지난 6월에 오픈한 신생 점포이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씨티은행이 특정 민족의 이름을 붙여 점포를 개설하기는 뉴욕 코리아타운지점이 처음이라고 한다. 직원들도 모두 교포여서 마치 한국의 한 점포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씨티은행 코리아타운지점은 지난 6월에 오픈한 신생 점포이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씨티은행이 특정 민족의 이름을 붙여 점포를 개설하기는 뉴욕 코리아타운지점이 처음이라고 한다. 직원들도 모두 교포여서 마치 한국의 한 점포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애런 김 지점장(사진)은 "점포내에서 투자상담이 가능한 인력은 지금 상담중인 남자직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점포마다 2~4명 정도의 투자상담 직원이 있지만 신설점포라 아직은 1명만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점장은 씨티은행의 모든 점포에선 '예금업무'와 '투자업무'가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운지점 역시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들이 여럿 있지만 이들은 투자상담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한다.
예컨대 평소 친하게 지낸 고객이 찾아와 예금 창구직원에게 투자상품을 물어볼 경우 한두마디 대꾸야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인 조언이나 권유는 금지돼 있다. 전화로 펀드에 대한 문의라도 들어오면 수화기는 투자상담 직원에게 바로 넘어간다.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 예금과 달리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상품인 까닭이다. 투자상담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불완전판매(Mis-Selling)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자격증을 보유한 재무상담사(Financial Advisor)만 투자상담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불완전판매 땐 판매직원 영구 퇴출까지
김 지점장은 "미국에서 재무상담사의 목숨은 하나"라고 강조한다. 재무상담사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경우 잘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 이 뿐만 아니라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공개사이트에 관련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증권바닥에선 재취업마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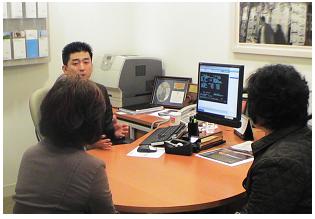 | |
| ▲ 코리아타운지점 투자상담 모습 | |
고객의 자산을 많이 유치하거나 거래를 많이 일어나게 할수록 상담사의 성과가 커진다. 이 때문에 가끔 고객과 상담사간에 다툼도 벌어진다. 물론 고객의 불만 내용은 기록으로 남는 만큼 상담사들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
◇ 상품 팔기전에 투자개념부터 이해시켜라..상담시간의 절반은 '투자교육'
김 지점장은 "투자상담의 50%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관리자로서 일선 상담업무를 하지 않지만 그 역시 재무상담사 출신이다. 미국계 메릴린치와 스위스계 금융그룹인 UBS에서 한 때 7000만 달러의 자금을 책임지기도 했다.
그는 "고객이 투자를 이해해야 상담도 가능하다"며 "어떤 때는 손님을 만나는 시간의 대부분이 투자에 대한 교육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의 질문수준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선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한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린다. 우리의 경우엔 공과금을 내거나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잠깐 들렀다가 권유에 마지못해 펀드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펀드붐에 편승한 묻지마 투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엔 10~20분 안팎으로 상품가입이 종료된다. 예대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창구직원들에게 '투자교육'까지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김 지점장은 그러나 "투자상품 가입전에 손님에게 투자의 개념 만큼은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은행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을 잘하면 더 높은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투자교육도 서비스란 얘기다.










![[포토]고생했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524t.jpg)
![[포토] 걷고 싶은 거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206t.jpg)
![[포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69t.jpg)
![[포토]1400원 뚫은 원-달러 환율…외환당국 '적극개입' 시그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21t.jpg)
![[포토]송길영 작가 "지상파를 역전한 넷플릭스" 기조강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082t.jpg)
![[포토]외규장각 의궤 전용 전시실 일반에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057t.jpg)
![[포토]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713t.jpg)
![[포토] 2025학년도 수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625t.jpg)
![[포토]벼랑 끝에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72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