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12월 한겨울 바람이 휘몰아치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야산. A씨 앞에 선 남성 여럿은 삽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펀드매니저 출신 투자가 A씨가 이들에게 종목을 추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A씨가 추천한 주식을 이들은 당시 2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홧김에 A씨를 납치해 폭행하면서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주가가 떨어져 눈이 뒤집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일당이 남긴 말(경향신문 그해 12월29일치)이다
주식 투자가 일반에까지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평가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주식 갖기’를 독려하던 시기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대표 시절(1988년) 국민주 공모 열풍이 일 당시에 포항제철과 대우, 조광페인트 등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당시 주식 시장에는 ‘장님도 주식하면 떼돈 번다’는 말(경향신문 1991년 10월2일치)이 있을 정도였다.(특정인 비하 발언일 수 있으나, 당시 소개된 말이기에 전함)
C씨도 비슷한 사례였다. 1987년 처음 주식에 손을 댄 그는 한때 수십억원을 주무르던 덩치깨나 있던 개미였다. 투자금은 초창기 3억여원에서 곧 20억원 가까이로 불어났다. 결혼자금, 융자, 사채를 끌어모은 결과였다. 그러나 주가는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손해를 만회하려던 그가 이 돈을 담보로 50억원치 외상 주식을 사면서 사달이 났다. 그래도 주가는 하염없이 빠졌다. 그는 1991년 흉기를 들고 증권사를 찾아갔다. 종목을 잘못 추천한 직원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채근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투자금이 아니라 구속 영장이었다.
고객에게 받은 압박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곤 했다. 증권사 직원 D씨는 1994년 5월 술에 취해 고객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D씨와 고객이 현장에서 불에 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고객이 자신을 상대로 금융당국에 낸 진정 탓에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객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손해가 발생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커지는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 비극을 선택했다.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하나다. ‘손실은 증권사 책임이다’ 이 말이 참이려면 ‘이익이 나면 증권사 덕’이라는 말도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익은 모조리 투자가 몫’이라는 게 불문율이다. 그렇다면 ‘손실 책임도 오롯이 투자가 부담’이어야 할 테다. ‘증권사 직원 덕에 큰 돈을 쥔 고객이 답례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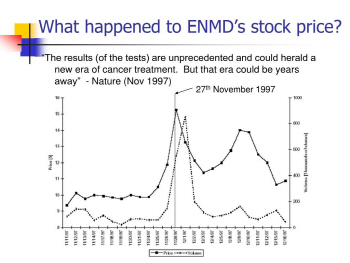












![[포토] 송민혁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474t.jpg)
![[포토] 화사, 매력적인 자신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93t.jpg)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