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사찰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
이후 경찰은 응급조치가 끝난 A씨가 병원 이송 대신 귀가 의사를 밝히자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1층에 데려다준 뒤 철수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집 앞 4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머리 뒤쪽에서 골절 증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KBS에 “코피가 흘렀으면 병원으로 데려갔어야지 왜 혼자 사는 사람을 집에 (놔주고 가고) 그렇게 했나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주취자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비판이 제기되자 보호조치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골목에서 만취한 50대 B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으나 B씨를 길가에 둔 채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 강북구 다세대주택에서는 경찰이 한파 속에 대문 앞에 앉혀 놓은 60대 주취자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
주취자 관련 112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 1911만 7453건 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6392건으로 5.11%를 차지했다.
신고에 따른 조치를 보면 지난해 기준 현장 조치가 6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귀가조치(15.2%), 병원인계(0.7%), 보호조치(0.6%) 순이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이 개정됐다.
개정된 메뉴얼은 종전에 단순 주취자, 만취자로 구분해오던 것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를 신설한 것으로, 이 경우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에서 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취자의 상태와 날씨, 장소 등을 고려해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보호시설로 인계해 경찰관서에서 맡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 실증 과정을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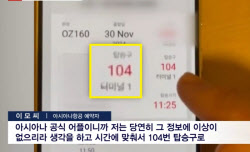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포토]최상목 "野 감액안 허술한 예산…무책임 단독 처리 깊은 유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44t.jpg)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1074b.jpg)

!["1.5억의 위용".. 강남에 뜬 '사이버트럭' 실물 영접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94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