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에 가깝다. 경기는 상승만 하거나 하강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극심한 침체를 겪기도 한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불황에 빠지곤 한다.
고속·고도성장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여러 경제상황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 익숙할 뿐이다. 1960년 이후 50년 넘게 봐 왔으니까.
|
이는 요렇게 요약할 수 있다. ‘생산 기술의 발달로 ‘팔아야 할 제품’이 늘었는데 이를 사 줄만한 시장이 부족하다.’ 게다가 당시 자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만 몰두했지 그들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의 구매력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른바 비용절감을 위한 감원이다. 당장 싼 원가에 제품을 팔 수 있게 좋았지만, 팔리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불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조반나 아리기의 사회학저서 ‘장기20세기’(영문명 The Long Twentieth Century)에 한 예가 나온다. 1813년 영국 방직 산업에는 20만명 이상의 수동 직기 직공이 있었다. 1860년이 되면서 40만개의 동력직기가 가동하게 되고 이들(수동 직기 직공)의 일을 대신한다.
|
사람들의 지갑은 비는데, 시장의 물건은 넘쳐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필히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영국 등 서구 열강을 기준으로 대불황기였던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영국의 물가 하락률은 40%에 달했다.
이때의 또 한가지 특징. 영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독일의 거센 도전에 영국은 직면했다. 이들 후발국들의 제품은 영국 제품을 밀어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수십년째 국제무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하다.
1873~1896년 대불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준다.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의 구조는 19세기나 21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경제 순환기 속에서 국제 질서도 바뀌곤 한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에 제조업 역량까지 갖추고 있다. 국방력도 최근들어 미국을 긴장시킬만 하다. 기존 강자에 대한 신흥 강자의 도전 구도다 (물론 중국은 ‘역사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듯 하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역사관이다.)
한가지 심히 걱정되는 것은 대불황기 이후의 국제질서다. 대불황기 이후 영국의 힘은 약해졌고 식민주의 쟁탈전에서 소외된 후발 열강들을 중심으로 파시즘이 나타났다.
파시즘에 입각한 독재자들은 내부에 쌓인 갈등과 불합리를 외부의 적을 대상으로 풀려고 했다. 이를 위해 독재자들은 자국민들의 증오를 자극하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1·2차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괴물처럼 만들어냈다.
21세기 초반을 넘어서는 지금은 좀 다를까? 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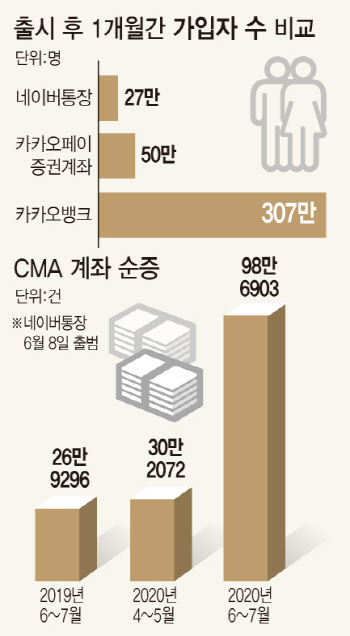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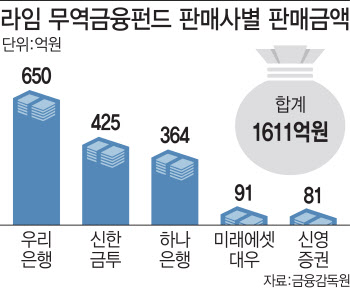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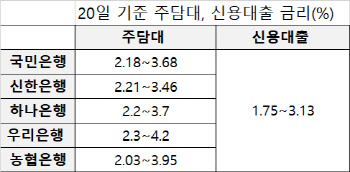






![[포토]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25년 시장 전망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886t.jpg)
![[포토]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물 마시는 이창용 한은 총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833t.jpg)
![[포토]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810t.jpg)
![[포토] 서울역 환승센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768t.jpg)
![[포토] '질퍽거리는 눈 피해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590t.jpg)
![[포토]이재명, 한국거래소 찾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462t.jpg)
![[포토]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406t.jpg)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700981t.jpg)
![[포토]서울에 117년만에 폭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700882t.jpg)
![[포토] 휘슬러x구세군 사랑샘 자선냄비 체험관 전달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700766t.jpg)




